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일에 무던한 체를 하면서도 근본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인물이다. 내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일찍이 간파하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스무 살쯤엔 요절할 천재일 줄만 알고 ¹ 유년기를 다 보냈을 리가 없다. 아버지의 세뇌에 가까운 심리 치료술 덕이었다.
¹ 체리필터, <Happy Day>에서.
‘난 내가 말야 스무 살쯤엔 요절할 천재일 줄만 알고 / 어릴 땐 말야 모든 게 다 간단하다 믿었지’
그는 말수가 적다. 뭘 물어봐도 두세 번은 재촉해야 겨우 대답을 해서 엄마와 나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취기가 돋으면 말문이 터지는 경상도 어른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술을 그다지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것이다. (조금 부족한 열정맨이라니 장문복이 따로 없다.) 맨정신이면 용건만 간단하지만, 술이 오르면 매우 다양한 용건을 늘어놓는다. 불교 한 시간, 명상과 참선의 순기능 한 시간, 대통령 욕 두 시간, ‘네가 어릴 때 천재 소릴 들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세 시간…. ‘가족사’는 그 와중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금이야 늙어가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소중할 뿐이므로 아무래도 좋다. 하지만 곤란할 때도 있다. 그는 소주 한 병으로 벌써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크다. 가끔 술집이나 중국집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껴야 했던 적이 많았다. 그런 경험은 꼭 낯뜨겁다기보다는, 우릴 쳐다보는 다른 취객들의 심리를 추측해보게 만든다. 아들이라기엔 덩치가 너무 크고, 손주라기엔 수염 자국이 너무 선명한 사내는 대체 저 어른과 무슨 관계일까? 저리 쩌렁쩌렁한 발성으로 한다는 게 겨우 영양가 없는 좌우 정치토론이야? 뭐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
물론 그에게 강력한 울림통을 물려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런 모습조차 좋게 보는 단골 화상(華商)에서 간혹 고량주 한 병씩을 선물 받기도 한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보기 좋네요, 라는 오해는 웃음으로 눙치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현직 대통령 비판이라면 눈빛도 목청도 창창하시다. 내용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뭐가 문제겠나. 오히려 반갑다. 나는 그가 어느 날 더럭 쇠잔해지는 게 두렵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술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친척들 앞에서 시전하던 레퍼토리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자기방어적 자식 자랑이다. 우리 집안은 유독 공부 머리가 유난하다. 내 사촌 형제들은 물론 삼촌들까지도 모두 대단한 학교를 나왔거나 전문직에 종사한다. 질투할 여지도 없이 사람도 좋은 대단한 호인(好人)들이다.
나는 그 사이에서 일단은 대단한 늦둥이여서, 마지막 남은 가문의 유망주 대접쯤을 받았다. 분명 어쩌다 생긴 티끌 같은 존재가 나였지만, 그렇다고 존재감이 영 없어서도 안 되었다. 징징거리기는 싫지만, 여남은 살부터 중용의 길을 걷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아마도 아버지는 어느 명절날 뭔가를 결심하셨던 모양이다. 의도치 않게 자식 자랑이 흐르는 듯한 당신의 형제들 앞에서 말이다. 하기야 자식이 마이크로소프트사(社)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산다는 얘기는 발화 의도와 상관없이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는 빛바랜 소주잔을 홀짝이다가 별안간 내 자랑을 늘어놓고는 한 것이다.
내가 육전을 주워 먹거나 술잔을 채워드리기 바쁜 사이 그가 “저놈이!”로 운을 띄우는 것은 대단히 카랑카랑했기 때문에, 고모나 삼촌들은 그게 무슨 신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분들이 맞장구를 덧붙여주면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그리고 절정에 나오는 일종의 클리셰가 바로 그 레퍼토리였다. 그러면 도무지 칭찬 거리를 찾아내기 어려운 나에게서 또 무슨 덕담을 추려주실지 귀를 기울이고는 했다.
“(다른 친척 형, 누나들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저놈도 보통은 아니야.”
“보면 피부도 좋아!” (나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유년에 고생했다.)
“얼굴도 조그만하구.” (육군 58호 베레모를 착용하는데, 벗고 나면 손오공의 긴고아처럼 자국이 남는다.)
“눈도 제 아빠 닮아서 귀엽잖아.” (우리 부자는 처진 눈이 똑 닮았다. 사진을 찍으면 눈이 안 나오는데, 이건 의료보험 감이다.)
이쯤 되면 아버지도 복식호흡에 들어가며, 나도 겸연쩍은 웃음을 만면에 띄웠다.
“저놈이 한글을 두 살 반 만에 깨쳤어.” (꼭 ‘만’ 두 살 반이란 얘기는 않으신다)
부터…
“이놈이 수재는 수재야. 내가 얘를 어릴 적부터 책방에 데려갔거든…”
으로 본인 덕을 삽입하시고는,
“우리 집에 남자가 아직 서울대를 못 갔는데 이놈이 할는지도 몰라.”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알죠’.)
레퍼토리의 마지막은 용돈을 하사받는 훈훈한 그림으로 마무리되고는 했다. 내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쯤 되었을 때까지의 이야기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 뭉치와 담임 선생님들의 칭찬들이 무수했고, 그건 그대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들이었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생전에 써 주신 기대 가득한 편지를 기억한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중 하나에 합격하여라.’
합격해서 집안을 빛내라든지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고시에 합격할 운명으로 태어난 인재이니 그 소명을 이행하라는 지엄한 말씀이었다. (그러니 혹시 이 글을 읽는 열 살 남짓의 천재가 있다면… 일단 공부는 대강 중간만 해서 기댓값을 낮추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의도를 의심해보는 걸 당부한다.)
그랬다. 어른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다. (집을 지켜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고마워요 아버지, 열심이셨다는 거 알아요.) 이를테면 ‘생각안정제’ 작용이라고 할까. 나도 내가 서울대나 거기 준하는 학교에 갈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알수록 점입가경이었던 가정사를 고민하거나, 팍삭 망해가는 집안 꼬락서니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런 몽상에 빠지는 편이 훨씬 안온했다. 내 유년은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물론 진짜 고난은 다가오지도 않았었지만 말이다. 아,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².
²홍대 1세대 모던 락 밴드 마이 앤트 메리(My Aunt Mary)의 5집 <Circle>의 수록곡. 유희열이 극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노래를 좋아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에서 무언가 울컥 쏟아지는 느낌을 받는 건 그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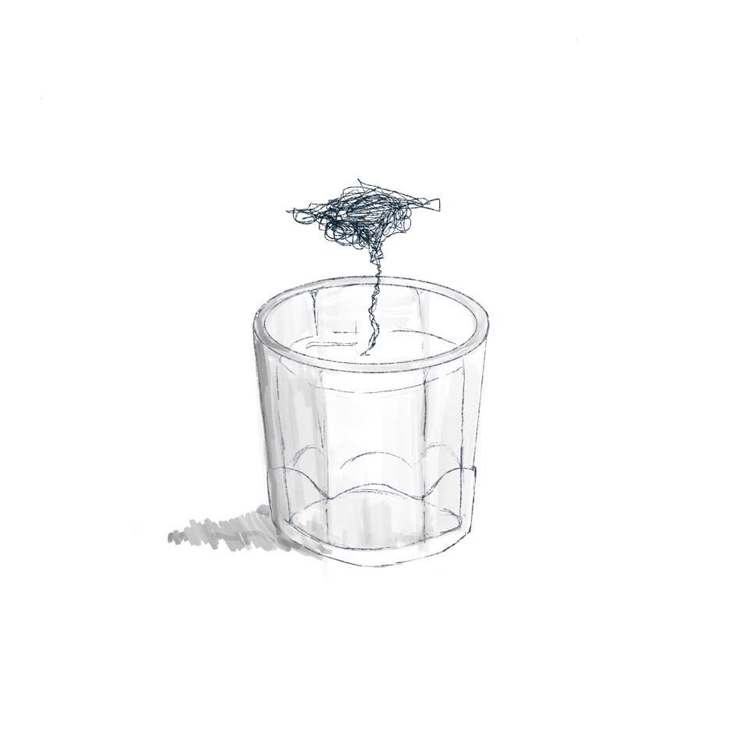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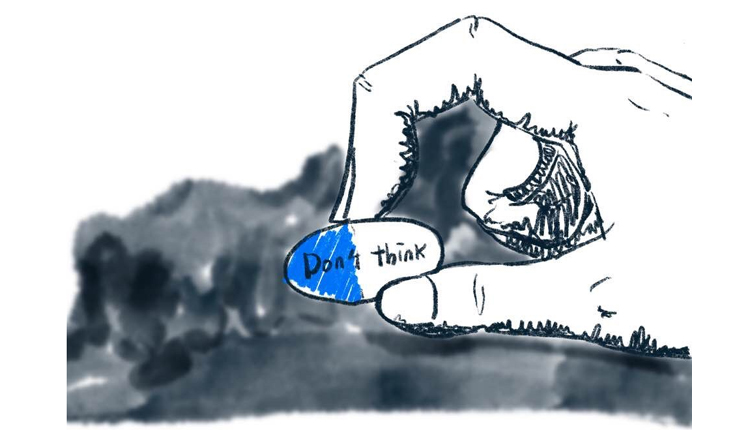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5. 재수학원 블루스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KakaoTalk_20200318_202022240-120x120.jpg)
![[언더독 컴플렉스] #6. 모르지만 알았던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Artboard-8@2x-100-120x120.jpg)
![[언더독 컴플렉스] #13. 스물셋은 밥솥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 (3)](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KakaoTalk_20200325_195928736-120x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