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열다섯 살 남자애가 첫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정수리에서 풋내가 진동하는 남학생들이란, 어느 날 활짝 핀 웃음을 마주치고는 그 길로 홀린 듯 빠져들 뿐이다. 첫사랑은 첫사랑인지도 모른 채 느닷없이 진행형이 되어 아주 많은 처음을 준다.
하지만 남자아이에게 우상이 생기려면 첫사랑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나 어리석고 깨지기 쉬운 내면을 가진 아이라면, 사랑할 이를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다.
남다른 취향을 단단히 쌓아 올리고 있을 그 무렵,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컴퓨터 앞에서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었다. 주로 ‘뮤즈Muse’나 ‘오아시스Oasis’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록에 심취한 아이들은 그들로 입문하기 마련이었다. 그런 애들은 보통 밴드부에 가입했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다. 전자기타를 칠 줄 안다면 메탈리카Metallica로 시야를 넓히고, 스틸기타를 더 좋아한다면 라디오헤드Radiohead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악기란 리코더도 겨우 잡는 수준이었으므로, 그냥 인터넷을 떠돌며 맘에 드는 음악을 찾아들었다. 그러다 홍대 인디 신을 알게 되었다. 방구석에서 탐험한 당대의 뮤지션들은 아름다웠다. 나도 <앵콜요청금지>를 수백 번 들었다. 국카스텐과 10cm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다. 한희정과 심규선 같은 이들에게선 설렘도 다가왔다.
하지만 번화가에서 홀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면 비스트로나 파인다이닝에 들어가긴 곤란한 것이다. 너무 멋져서는 곤란하며, 다가갈 수 없이 화려해서도 안 되었다. 내가 마음을 의탁한 이는, 라이브 공연으로 영접한 실물에 실망하여 팬들이 돌아선다던, 생김새부터 노랫말까지 투박하기 짝이 없는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라는 뮤지션이었다. 바로 2010년 봄이었다. 학교에 다녀와서 동이 틀 때까지 그의 디스코그라피를 모두 들었다. 다음날부터 그는 나의 커트 코베인[너바나(Nirvana)의 보컬. 역사상 최고의 락스타. 스물일곱 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되었다.
세상도 나를 원치 않아
세상이 왜 날 원하겠어
(1집 ‘절룩거리네’)
가지려 하지 마, 다 정해져 있어
세상의 주인공은 네가 아냐
(3집 ‘스무 살의 나에게’)
그에게 청춘이란 절룩거리는 존재였다. 그의 가사가 바라본 보통의 인생은 하나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스끼다시같은 것이었다.1집 <스끼다시 내 인생> 어차피 우린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지만, 이 멋진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책 없는 청춘 송가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힘주었다. 인생의 영토가 주공 1단지에 그친대도3집 <치킨런>, 무겁고 안 예쁘게 생겼어도3집 <도토리>, 스스로 행운아라고1집 <행운아> 일컬으며 그래도 하루를 살아내는 동력을 주던 것이다. 그는 그런 노래를 했다. 투박하지만 그게 좋았고, 가슴 속의 묵직한 근성을 다독여주는 목소리였고, 집 밖에서 찾은 최초의 동류(同流)였다.
그의 음악을 듣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생이 야구 경기와 같다면 만루홈런의 주인공은 어차피 내가 아닐 것이었다. 월요일에도 쉬지 않는 우리만의 야구에서 나는 보통 패전처리나 대타, 잘 해봐야 9번 타자일 것이다. 주전을 꿰찬 애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얄미운 선수겠지. 버킷햇을 멋지게 걸치고, ‘우리’ 엄마, ‘우리’ 집이라는 말에 조금의 이상함도 느끼지 않고, 노래방에서 힙합과 알앤비를 둘 다 기막히게 소화해내며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3루타를 친 것처럼 살아가는 녀석들.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괜찮았다. 요정이란 우상은 존재만으로도 힘이었다.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상처 입은 날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다면 족했다. 속내를 멋대로 지껄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멋대로 생각하며 스르륵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아무래도 괜찮았다. 궁상맞고 찌질한 아이에게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넘치게 충분했다.
타석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데드볼이란 요행을 바라는 마이너리거에게도 사랑할 권리는 있었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나는 그를 사랑했다. 덕분에 어릴 때 못 뗀 몇몇 낱말의 의미를 늦게나마 알 수 있었다. ‘애정’은 그를 생각할 때 배어나는 코끝 시큰하고 애틋한 감정, ‘공감’이란 그의 노랫말 자체, ‘위로’란 그에게서 내가 받은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말이다. 마치 로봇이 처음 심장을 달고 온기를 느끼듯이.
*
이렇게 유년의 아이돌을 맞이한 것은 그대로 신앙이 되었다. 문제는, 그때쯤 나는 오로지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의 협주만이 음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악보도 못 보는 락 근본주의자라. 의지할 뭔가를 갈구했기 때문일까. 종교도 없고, 부자도 아닌데다 흡연자도 아니니 뭔가에 매달리긴 했어야겠지. 원인이야 어쨌든, 나는 무엇이든 근본주의에 빠져드는 성깔이었던 것 같다. 다름아닌 홍대병일텐데, 컴플렉스의 또 다른 증상이었다. (마침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저 유명한 <알앤비>1라는 노래가 발매되었다.)
그 성깔은 매달 떡볶이값을 아껴 음원을 모으고 명절에 용돈이 생길 때마다 음반을 사다 놓는 습벽으로 발전했다. 그땐 그렇게 하는 걸 의무라고 여겼다. 좋아하는 밴드에게라면 누구든 그러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 세대가(일단 우리 세대는 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꼬박꼬박 CD와 MP3 파일을 모아놓는 것은 이제 대량생산 시대의 가내수공업처럼 괜한 일이 되었다.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취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좋은 노래는 여전히 많고 누구나 그걸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노래가 받는 제일의 대접이 멜론 재생목록 맨 윗자리 정도라는 건 최소한 미안한 일이다.
내친김에 궤변을 쏟아내자면, 홍대병-또는 중2병-이라는 나의 방어기제는 힙합과 EDM과 업템포 아이돌로 주류가 변하고 ‘락’이란 장르가 소멸하는 대세에 대한 처연한 항거였으며, 멜론 차트 1위라는 곡이 공장에서 온종일 음원을 스트리밍해 만든 조작의 결과물이건 아니건 “그래도 노래는 좋던데?”라는 모두의 정의 불감증에 대한 카산드라2 같은 예견이었다. 뭘 더 어쩌겠는가. 소유욕 그득한 어린애는 시대의 물결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양파 속에 감춰진 조그만 알맹이라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가장 겉에 있는 껍데기였고, ‘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보다 작은 껍데기였다. 동심원을 최대한 파고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 힙합과 영합한 배신자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 중고 음반과 600원짜리 음원을 끌어모으며 벽에 온통 ‘Rock will never die’를 써내리다 최후를 맞을 것이라 상상하는 가련한 꼬맹이가 있었다.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괜찮았다. 나에게는 요정이 있었으니까.
*
그런데 오월의 향기는 시월의 그리움이 되었다.3 우리의 만남은 얄궂게 짧았다. 2010년 11월 7일은 서늘한 늦가을이었다. 나는 망자들의 빈소가 칸칸이 늘어선 여의도 성모병원 지하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12010년 9월 8일 발매된 불나방 스타 쏘세지 클럽의 노래.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만 믿고
다른 음악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상술이라 믿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네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설리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2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왕국의 첫째 딸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지만, 아폴론의 저주 때문에 그녀의 예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저 유명한 헬레네에 비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옆 나라 왕자를 환장하게 만든 사고뭉치 딸래미의 미모가 호사가들에게는 좀 더 흥미로운가보다.
3언니네 이발관, <100년 동안의 진심>.
“오월의 향기인 줄만 알았는데 넌 시월의 그리움이었어
슬픈 이야기로만 남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네”
계속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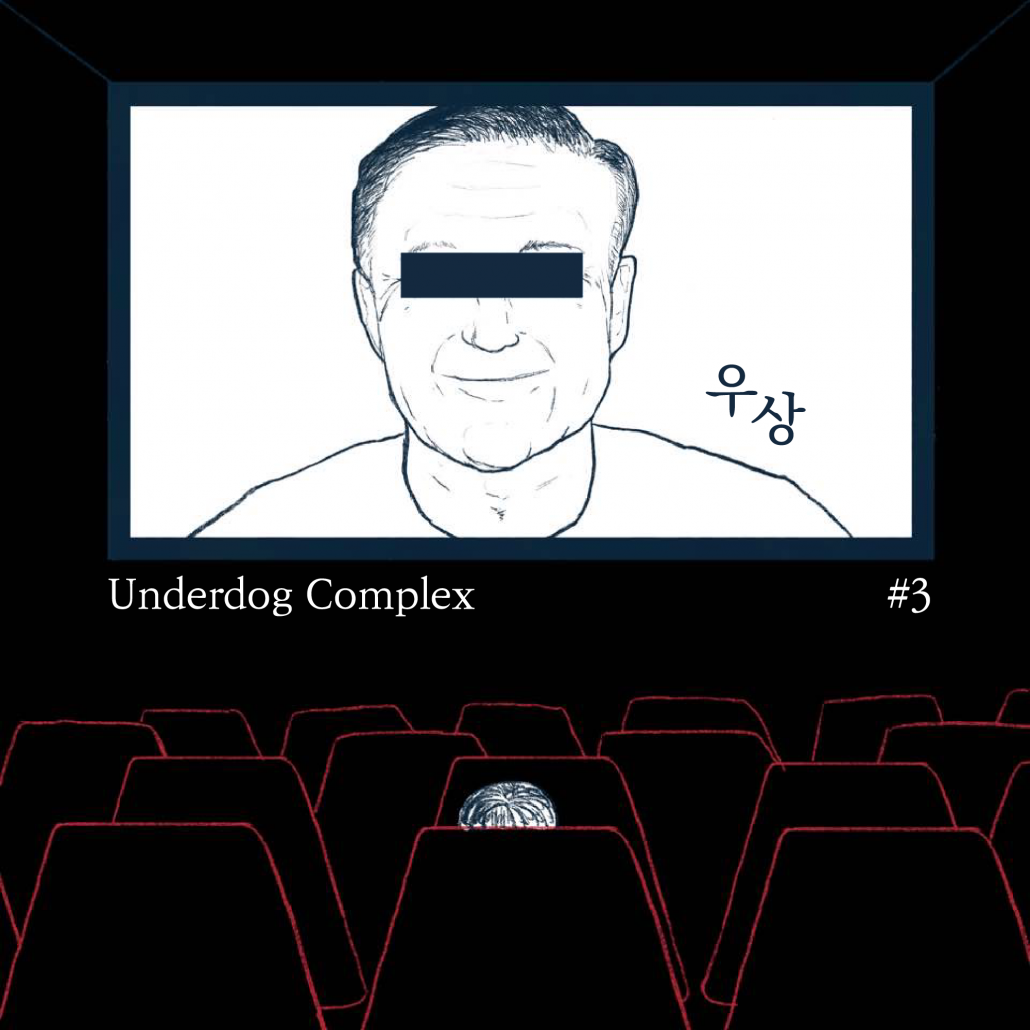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13. 스물셋은 밥솥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 (3)](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KakaoTalk_20200325_195928736-120x120.jpg)
![[언더독 컴플렉스] #8. 로컬 히어로의 와리가리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