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열아홉 살, 고등학교 3학년의 한여름을 무렵으로 우리 급우들 사이에는 해괴한 말버릇이 유행하였다.
“어제 수학 조졌다. 인생 망했어.”
“오늘 담임이랑 상담하고 왔는데 생기부(생활기록부) 열 장밖에 안 되더라. 인생 망했어.”
“디데이 100일 깨졌는데 우리 반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인생 망했네.”
“너 은정이한테 고백했어? 걔 학원에 남자친구 있는 거 몰랐냐? 오우야, 넌 진짜 인생 망했네?”
내신을 망쳐도, 곧 치를 수능이 막막해도, 식은 커피 같은 고백으로 사랑에 실패해도 우리는 한목소리로 ‘인생 망했어’를 노래했다. 물론 농담이었고, 매사 냉소 반 해학 반이던 나와 친구들의 특유한 성질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모두 비슷한 궤도의 인생 열차에 올라탔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의 면학 분위기는 분명 시원찮았고 우리 학교도 그랬다. 비슷한 동네에서 자라 비슷한 중학교에서부터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였다. 결말은 뻔했다. 어중간한 성적으로 3학년을 마치고 수능을 치른 뒤 어중간한 대학에 갈 것이다. 당장 곤경에 빠진 건 시험 성적이나 무참히 끝난 첫사랑이었지만, 진짜 ‘망한’ 것은 앞으로의 인생 그 자체였던 게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발상이 그립기도 귀엽기도 해 웃음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웃음으로만 눙쳐지지는 않는 두려움 역시 갖고 있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거나 현실을 인정하고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걸 고3이 되고서야 깨달은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의미가 찬물에 서서히 몸이 젖듯 다가온 것이다. (대학은 당연히 삶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때 소년들의 시야라고 해봤자.)
입으로는 인생이 망했다고 엄살이면서도 수능특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런 자신을 검토하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불안을 도무지 부정할 사람이 없었던 게다. 그러나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앞날을 자조할 뿐이었다. 거 참 이타적인 친구들이었다.
그러니 농담이기는 했지만, 우리의 냉소란 얕은 것이었다. 다짐만 굳게 했다면 우린 다 명문대에 갈 수도 있었다. 수능이 뿌적뿌적 다가와도 우리는 독서실 현관에 걸터앉을 뿐이었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집과 인터넷 강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은 절친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열여덟 열아홉에 더 어울리지 않나.
“인생 망했네.” 한탄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오는 미래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독서실 문밖에서 맥주를 까먹으면서.
미적지근한 현실이 서늘히 다가왔지만, 열아홉은 누구나 스물이란 야릇한 수에 기대를 건다. 내년에 우리는 스무 살이 될 예정이었다. 다가올 캠퍼스, 합법적인 음주, 나이에 얽매이지 않을 모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등록증이 유의미해지는 시절을 기다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뿐인가, 마침 우리 96년생들은 대학 생활을 <응답하라 1994>(2013)로 배웠다. 멀리서 경의선 기찻길만 봐도 가슴이 뛰는 연대 정문과 캠퍼스의 빨간 벽돌담 사이 스며든 갈맷빛 같은 것들이, 스무 살이란 막연한 시간에 분명하게 끼어있을 것 같던 이미지였다. 거기서 피어날 젊은 우리 사랑은 <세 사람>(성시경이 부른 토이의 노래. 2014)처럼 애달파도 좋았다. 얄궂은 삼각관계 속 사랑하는 아이와 여름날의 멜로디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랬다. 나 또한 고등학교에 들어서 학업은 일순위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는 어둠의 남학생회장 비슷한 역할을 했다. 여자애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수능 기출문제가 머리 아파질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나. 내가 잘 아는 남자 놈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수밖에. 1학년 때는 친구들과 남자반의 마초 기운을 선동하여 여자반의 미움을 샀고, 다음 해 그대로 그들과 같은 반이 되어 우릴 미워하던 불쌍한 여자아이들의 기를 죽였다.
고3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똑같은 녀석들과 몰래 맥주를 사다가 만원 네 캔을 알뜰히 비우고 학교 앞 공원 노상에서 독서실로 잠깐 출타하던 한량 같은 날들이었으니까. 학업에 지친 청소년기의 낭만적 일탈, 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애당초 공부에 열심이지도 않았고 그때 나눈 꿈보다는 나눠 먹은 맥주 맛만 혀끝에 맴도는 듯하니.
그러니 뭘 기대했던 걸까. 나는 급우들 사이 ‘웃픈’ 분위기의 만연을 주동하면서도 그걸 은근히 남의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나도 스무 살이 될 예정이었다. 잊었나. 이씨 집안의 얼굴이자 최초의 남성부 서울대 합격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나. 열 살 이후로 대단히 미심쩍어진 운명이었지만 아무튼 믿고 싶었다. 수능에 허룩하게 대비한 학업성적과 함께였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자존감 상승 프로세스가 최후의 약발을 다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수능이 닥쳐드는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2014년 11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났다. 이미 정시 이전에 수시로 대학이 결정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시대였고, 수능이란 반쯤은 요식이었다. 수시 합격이 결정되는 9월께부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대개 성적만큼 정직한 대가를 받았다. 간혹 기대보다 못하더라도 안분지족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줄곧 독야청청 전교 1, 2등을 하던 모범생들은 역시나 좋은 학교에 갔다. 수능을 잘 봤어도 수시에 뒤늦게 합격해버려(‘납치’라고 부른다) 조금은 억울하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스무 살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물음의 답이 정해졌다.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더이상 아무도 “인생 망했어”를 연호하지 않았다. 유년은 끝날 것이고, 어른이 될 준비를 다 마쳐야 했다. 대책 없는 냉소와 해학은 그만두고 수용과 적응에 익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른으로 진화하는 시기를 일 년만 미루기로 했다. 하루에 꼬박 열여섯 시간을 매일 재수학원에 박혀 지내게 되었다. 11월 13일, 예상대로 수능에서 그저 그런 점수를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말이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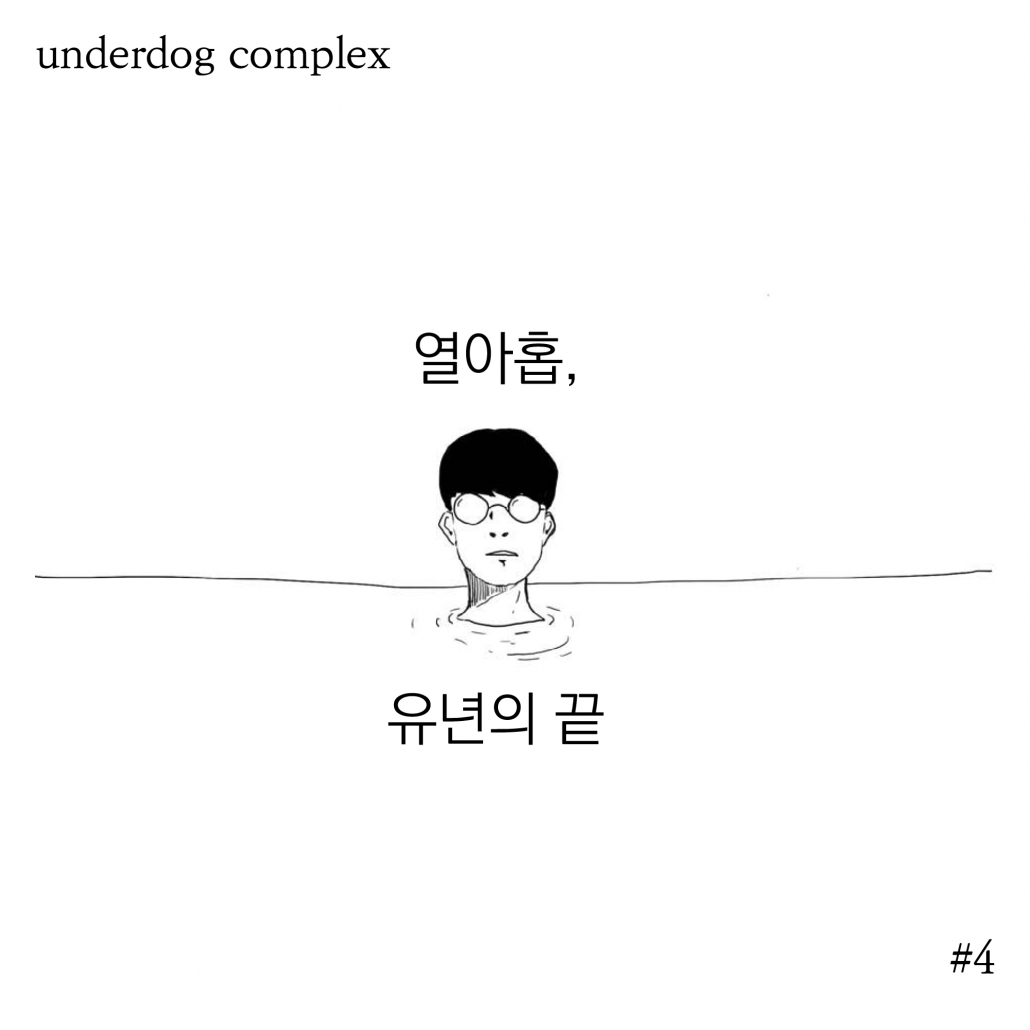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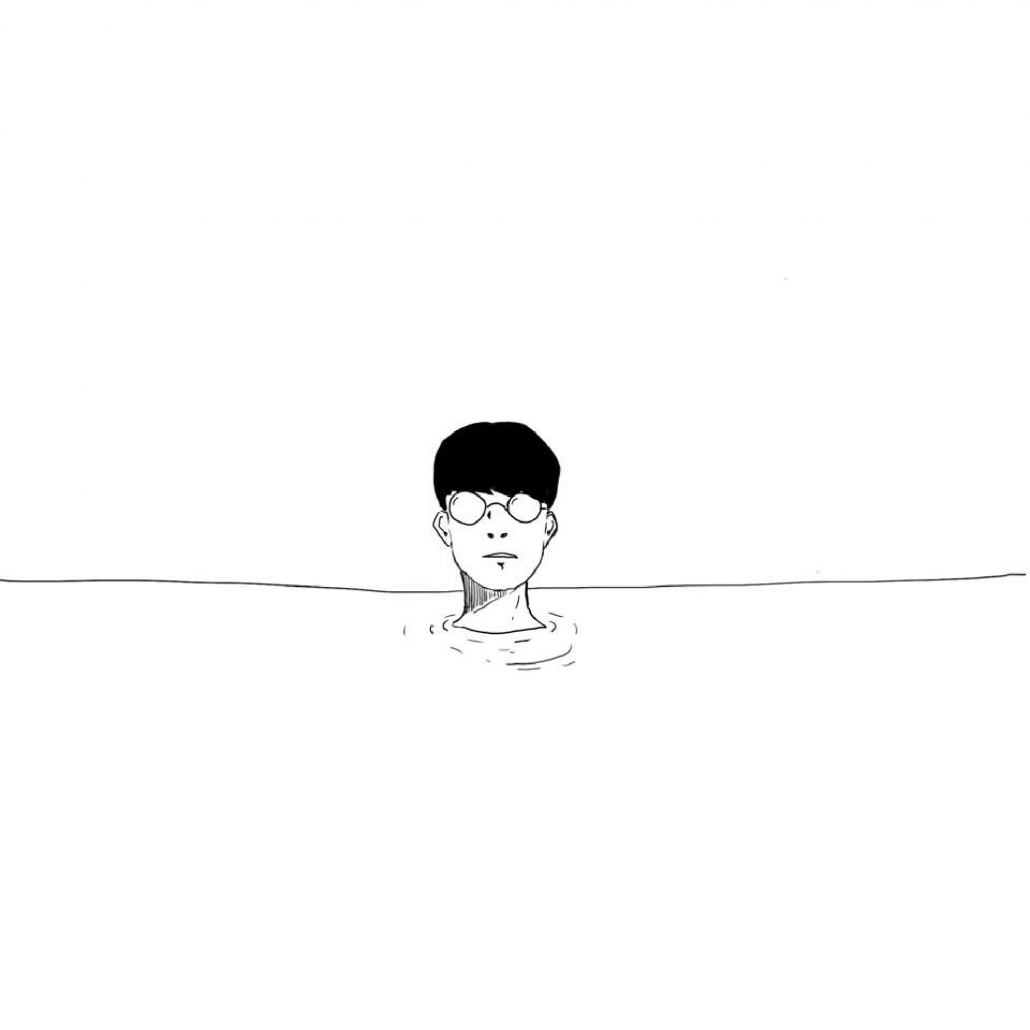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12. 유아인과 가장 나쁜 형태의 자기연민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
![[언더독 컴플렉스] #5. 재수학원 블루스 (2)](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KakaoTalk_20200319_151615400-120x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