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아 제 스스로 서는 것”_딸기의 ‘자립’ 그 앞에서>
딸기가 익었다, 빨갛게 곱게. 올봄 첫 딸기를 고이 입에 담는다. 짭짤하게 달큼하고 새콤한 맛,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
텃밭에 이 딸기를 처음 심은 때가 어언 5년 가까이 흘렀나 보다. 다년생이라서 한 번 심으면 애써 돌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나고 또 자라곤 했다. 그런데 올해는 전과 조금 달랐다. 이파리가 적잖이 늦게 올라오더니 열매도 한참 느지막이 달렸다. 딸기밭 앞에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젖었다.
‘다년생도 다 끝나는 때가 있는 걸까, 이제 더는 딸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 그래,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 더는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을게…’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언제 시들었냐는 듯 냉큼 푸른 이파리 내미는 딸기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딸기 맛보다 먼저, 딸기가 지닌 생명력이 내 안에 쑥쑥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참말 다행스럽게도 조금 늦었을지언정 올해도 딸기는 빨갛게 익었다. 거름도 물도 딱히 주지 않고 김매기도 해 준 적 잘 없는데 자연의 시간 따라 스러졌다가는 어느새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딸기.
익기를 기다리는 푸릇한 것부터 새빨갛게 익은 열매까지 대롱대롱 달린 딸기밭을 보면서 문득 ‘자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나 하고 싶고 해내고 싶은 그것, 자립. 딸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와 비와 바람이 돕기는 했겠지만) 저렇게 제힘으로 해내는구나, 생각하니 어찌나 대견하고 또 뭉클하던지!
딸기를 보고, 또 먹고 나니 ‘자립’에 대해 깊은 생각을 안겨 준 한 책에 다시금 손이 간다.
헌책방 꾸리는 이야기를 보려고 조금은 무심한 듯 펼쳤다가는,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촌살이에서 어찌 자립을 일구어낼지 참말로 진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든 책.
자립은 우리를 잡아매도록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해 그것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 내가 가진 본연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 주변에 좋은 변화의 기운을 나누는 것, 이것으로 만족한다. 자립은 복잡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며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일까? 버텨낸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알겠다. 자립이란 ‘살아남아 제 스스로 서는 것’인데 혼자 서면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자기 혼자만 일어서는 것은 결국 제 혼자 사는 삶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여럿이 함께 설 수 있는 자립이 필요하다.
_<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에서
저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좋아서 마음에 콕콕 새겼더랬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아팠더랬다. 내 한 몸 자립도 버거워 힘들다고 바둥대며 남몰래 눈물짓는데 여럿이 함께 서는 자립을 어찌 감히 꿈꿀 수 있을까, 용기도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한없이 무기력한 내가 한없이 싫고 부끄럽기도 했다.
새콤달콤 딸기 덕분일까. 이젠 저 글 앞에서 아픈 마음이 일렁이지는 않는다. 더디 가더라도, 많이 모자라더라도 우리, 같이, 더불어 함께 자립하는 길을 이제라도 이제부터라도 뚜벅뚜벅 일구어 보자는 의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피어난다. 스스로 앞가림을 하면서 제 스스로 서고, 더 나아가 여럿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자립.’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딸기 앞에서 마음 다잡아 본다.
아… 그러나저러나 그저 땅과 하늘의 힘만으로 자란 텃밭 딸기는 그 맛이 참으로 일품이다. 작은 딸기 큰 딸기, 상처 입은 딸기까지 맛도 모습도 모두 개성 넘치는 텃밭 딸기야, 덕분에 많이 배우고 또 힘을 얻었어. 올해도 변함없이 잘 자라 줘서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워! 너의 자립을, 그 생명력을 잊지 않고 간직할게, 기억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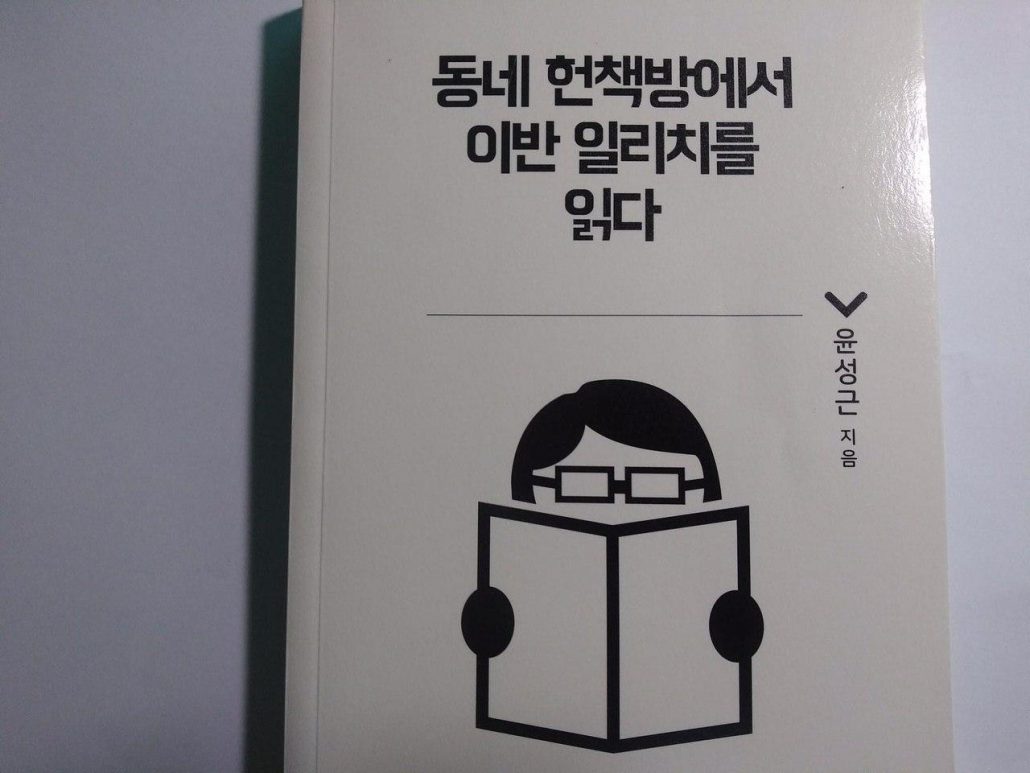
![[조혜원의 장수일기] 누가 나를 쓸모 있게 만드는가 – 열무김치를 담그며](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6/photo_2020-06-03_10-43-59-120x120.jpg)
![[조혜원의 장수일기] 가을편 – 내 것이 아니어도 참 뿌듯한 황금들녘](http://2-um.kr/wp-content/uploads/2017/11/가을들녘-3-120x120.jpg)
![[조혜원의 장수일기] 산골마을에 찾아온 손님들 : 첫번째, 프리다수진](http://2-um.kr/wp-content/uploads/2018/08/16569878a28ac22aa286-120x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