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유아인과 가장 나쁜 형태의 자기연민 (2)
→ #12. 유아인과 가장 나쁜 형태의 자기연민 (4)
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유아인이 한창 폭격을 당하던 그 때,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를 옹호한 뒤 학회의 여학우들 몇에게 언팔을 당했다. 댓글이 달리지도 않았고 ‘욕이 박힌’ DM을 한 사람도 없었지만 말이다. ‘손절’은 그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졌다. 언팔로잉은 팔로잉과 달리 알람이 가지 않아서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걸 금방 알아차린 것은 허룩하게 줄어든 ‘팔로워’ 수뿐이 아니었다. 개중 한 명이 나를 저격하는 글을 써 올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성 여성주의자였지만,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미워하거나 피하지는 않았다. 언제나 ‘주의’는 문제가 아니다. 이념을 위시해 헛짓거리를 정당화하는 ‘주의자’ 일부가 문제지. 토요일마다 만나 가끔 얘기하던 그녀 또한 좋은 사람이었다. 평상시의 언행이 마땅히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성을 붙잡으려고 의식하면서도 결국은 감정의 지배를 수용하는 나보다 훨씬 지성인에 가까웠다. (이게 바로 내가 사회과학에 관련된 일이나 사회성 짙은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걸 단념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기자가 된다면 균형 있는 기사를 내보낼 수 없을 것이고, 정치를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 선택을 피하고 잠적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나는 성별에 관한 문제를 논쟁하고 싶지 않았고 논쟁에서 이길 자신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성향에서 언뜻 약간의 모순이 비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었다. 그녀와 나는 함께 신입생 대표로 뽑혔었기에 가끔 연락했다. 처음 커피를 마셨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 자세한 사연은 기억나지 않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던 나에게 가족사를 꺼내든 것이니 그 감정의 깊이를 짐작할 법 하다. 나도 철(이 지금보다 더)없던 시절 아버지의 옛 사연을 뜬금없이 꺼내들어 술자리의 싸해지는 분위기를 조장하고는 했었다.
하기야 이 나라 가부장제의 원죄란 부계유전이 아니던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남 얘기로 들려오지만은 않았다. 내 양가감정과 그녀의 일방적 미움(적어도 그때 들려준 얘기만으로는)은 결이 다를 것이니 감히 ‘공감’한다고 하기는 뭐했다. 다만 그 마음의 발현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내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유럽에서 반 년 동안 지냈다고 했다. 오, 돈은 어떻게 모았어? 라고 하니 모두 아버지가 대준 비용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광고대행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큰 광고 학회의 장점은 현업에 있는 선배들의 인맥이다. 그 공모전은 공개경쟁이 아니었고, 선배들 덕에 빈 공간 가득한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어찌어찌 예선 없이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 대행사가 맡은 상품은 L사의 공기청정기 신제품이었다. 주어진 과제는 헤드카피(요컨대 영화 <건축학개론>의 헤드카피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가 되겠다.)를 짜는 것이었다. 타겟은 3040 주부.
두 명이 한 팀으로 네 팀이 모였다. 우리는 대행사가 준 대외비 자료를 받아들었다. 실제 타겟의 FGI(Focus Group Interview). 제품을 사용해 본 주부 15명의 인터뷰 영상과 설문 파일이었다. 대학생들이 구경도 못해볼 실제 자료였다. 그것을 토대로 ‘대학생의 참신함을 가미해’ 아이디어를 짜 와서 현장에서 두 시간 동안 만든 카피로 경쟁하는 형식이었다.
핵심은 ‘먼지’였다. 두 시간여에 걸친 엄마들의 토의는 거의가 중국 발 미세먼지에 관한 것이었다. 창문을 열 수 없고, 그렇다고 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불안은 컸다. 밖에 내보내는 것이 무섭다, 집에 오면 공기청정기 앞에서 옷을 털도록 한다… 중국 박쥐 발 전염병이 만연한 지금 생각하면 이마저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익한 대회였다. 현업에 종사하는 AE들이 팀마다 붙어 아이디어 회의부터 카피 도출까지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나야 ‘글’이라면 근거 없이 몸이 달아오르곤 해 의욕적으로 이런저런 카피를 짜 갔다. 크게 고쳐야 하거나 아예 반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는 ‘먼지’가 불안요소이니 이 단어를 직접 넣는 게 어떻냐고 했다. 그건 반응이 괜찮았다. ‘먼지’란 우리말이 조금 직선적인 듯 해 ‘더스트Dust’라는 영어를 사용해 카피를 만들었다. 그건 단어가 좀 어렵지 않나? 옆 팀을 도와주던 여성 AE의 반응이었다. 우리 팀을 봐주던 분도 이렇게 말했다. “타겟을 고려하면 단어 선택이 어렵다. 에어Air, 홀Hole, 프레쉬Fresh 같은 건 주부들이 알아듣는다. 그런데 더스트는 한 번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로 수긍하고 다른 카피를 다듬었다.
정말 카피라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오, 정말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려운 거구나, 단어 선택 하나에도 카피의 힘이 달라지나보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유익한 에피소드로 여겼었다.
그 공모전은 나와 다른 여학생 둘이 나간 것이었다. 그 다음 주 동아리 뒤풀이에서 놀림삼아 ‘어땠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나는 그 ‘더스트’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AE들이 막 코치를 해주는데, 내가 생각도 못한 걸 지적해주시더라고… 한데 돌아오는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 사람 누구야? 진짜 ‘빻았다’,1
남자 AE들 ‘빻은’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여성 주부들이 그 단어를 모른다고 단정할 수 있냐, 라는 것이었다. 대화 주제는 별안간 광고업계와 한국에 만연한 여성혐오로 바뀌었다. 집단적 성토는 결국 현상이 아니라 대상이 될 구체적 외집단이나 인물 개개를 찾게 된다. 그리하여 ‘한남’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 나머지 여성들이 일주일 동안 겪은 ‘한남’ 사례를 결산하는 자리가 되고, 오빠는 한남 아니죠? 하면 까르르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다. 예닐곱 명쯤 앉은 테이블에 남자는 나를 포함해 둘뿐이었다. 그러다 누군가 내게 “그 말 한 거 남자죠?”라고 물었다. 내가 그 AE들이 여성이었다고 말하자 그 분위기는 일단락되었다.
그로부터 세 달 뒤 나를 저격하고 손절한 그녀 역시 그 자리의 일원이었다. 테이블에는 소주병이 두 병인가 남아 있었다. 얼마지 않아 동내고 일어났다. 담배는 못 피우고, 단 것이 먹고 싶었다. 초코우유 아니면 딸기우유, 아니면 베지밀 B.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 AE들이 남성이었기를 바랐다. 그랬다면 나 또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입을 닥칠 순순한 마음이 발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선명히 기억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사실, 남성 성토의 장이 벌어지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남자들은 그 집단에서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남성들은 그냥 허허실실로 웃고들 있었다. 티 나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었을까? 그 광경을 보고 자란 오기 때문인지, 나는 술자리의 끝에는 꼭 남자들을 테이블로 모아놓고 누구도 끼어 들 수 없는 우리만의 농담으로 왁자하게 웃고는 했다. 그럼에도 유달리 울화를 참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젠더 이슈,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히던 시기였다는 것이 두 번째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술자리의 울분과 그것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인과관계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어디 인간사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던가? 나 역시 있는 그대로 사고할 수 없게 만드는, 나쁜 형태의 자기연민을 온 몸에 감고 있었다.
계속
1 강성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트위터 등지에서 차별적이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인물을 두고 쓰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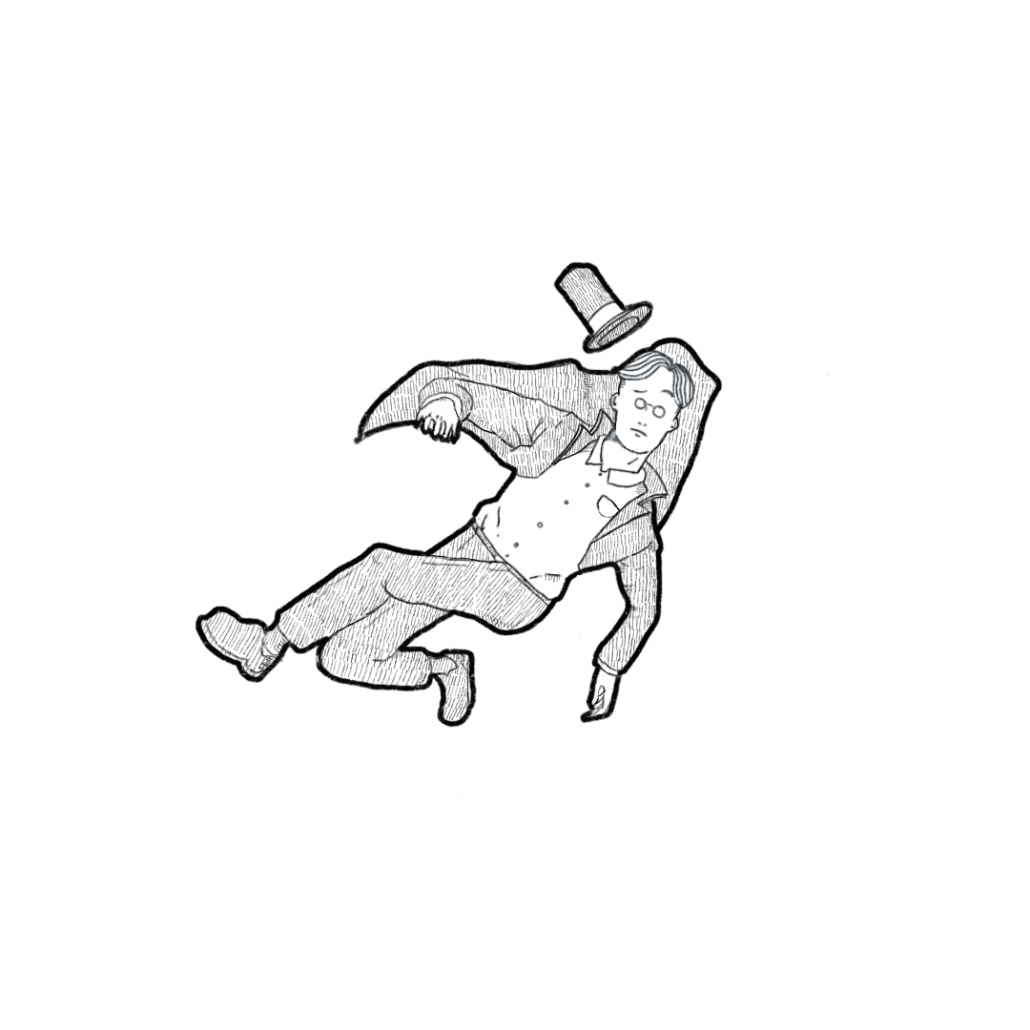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6. 모르지만 알았던 (4)](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4/KakaoTalk_20200419_154649795-120x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