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유아인과 가장 나쁜 형태의 자기연민 (3)
→ #12. 유아인과 가장 나쁜 형태의 자기연민 (5)
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그때쯤 나를 성가시게 했던 것은 건강보험 고지서였다. 뜻밖에 내 앞으로 한 달 19만원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단 걷고 나서 돌려주는 게 거의 모든 조세의 원칙인 것 같다.
갑자기 과중한 보험료가 부과된 이유는 대강 세 가지였다. 일단 학원에서 일하던 것이 소득으로 계산되었다. 나는 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거라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이 경우에는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는 월세로 살던 아파트 때문이었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 우리 집은 아주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십 년간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월세 임차인이라도 건강보험료는 전세로 환산해 산정하는데, 대폭 올라버린 전세가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지막은 내 가족관계였다.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간 이래 우리 집은 엄마와 나, 2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였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직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데다 엄마와 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아니었다. ‘동거인’ 말이다. 보통이라면 내가 ‘피부양자’가 되어서 보험료가 대폭 깎였어야 했다.
19만 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야.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공단을 찾았다. 소명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한가요? 네,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면 되겠네요.
다음날 서류를 다 떼어갔는데 담당공무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처리가 왜 안 되지? 박 주임님 이것 좀 보실래요? 그가 지나가던 다른 이를 불렀다. 뻘쭘하게 앉은 나를 앞에 두고 공무원 둘이 모니터에 달라붙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와 엄마의 특수한 동거관계를 말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저기… 제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는 아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등본을 하나 떼 오셔야겠는데요.
이틀 동안 건강보험공단을 두 번, 주민센터를 한 번 찾은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는 공공기관이 열려 있을 때 통학을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올 수도 없었다. 엄마가 일하는 시간은 나보다도 길었다. 운 좋게 학교 건학기념일이 끼어 있어 주중에 시간이 비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통명사로 건학기념일이지, 사실 ‘공부자탄강일(孔夫子誕降日)’이었다. 그렇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구 S대학교는 공자의 탄신일에 쉰다.) 이틀 동안 오후 두세 시나 되어서 공단을 찾았었던 나는 당황했었다. 감히 어떻게 자신을 연민하랴. 아쉬운 쪽이 누군데 아침 일찍 나갔어야지.
그 다음에 공단을 찾자니 납부 기한은 다가오고 시간은 나지 않을 듯 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야 했다. (매사에 아쉬운 쪽이 되는 사람의 행동양식 중 하나는 뒤늦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편을 고르려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생각이 많지 않으면 안 된다! 안 하면 ‘좆 되는데’.) 다음날 세 시간 공강이 있었다. 가장 가까운 공단은 명동의 중구지사였다. 혜화동에서 명동이라면 변수를 고려해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다. 하지만 처리는 또 불발되었다. 이번엔 내가 아버지 쪽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다는 게 문제였다. 삶이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지만, 좀 한 번에 알려주면 안 되는 걸까.
이쯤 되니 짜증이 났다. 가끔 동사무소에서 꼭 직원들에게 역성을 내는 할머니들을 볼 수 있다. 아저씨도 많고 아줌마도 많지만 제일 흔한 건 할머니들이다. 이것은 별로 잘 살지 못하는 동네 주민센터의 특징이기도 하다. 레퍼토리도 비슷하다. 왜 안 되냐, 저번에 직원 누가 된다고 했는데, 떼 오라는 거 떼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마구 소리를 지르며 그러는 꼴을 나는 정말 싫어했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사족을 붙이고, 가져오라는 서류는 하나씩 늘어나고, 또 다음에 언제 올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달력을 펼쳐봐야 한다면 속이 멀쩡하기는 힘든 거다.
솟구치는 자기연민이 또 다른 매개체 하나-창구 직원의 퉁명스러운 말투나 처리가 되었냐고 재촉하는 엄마-만 찾아 화학적 결합을 시도했다면, 나 역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에게는 잘못이 없었으니까. 굳이 잘못을 찾자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따져보지 못했던 나에게 있었다. (경우의 수 말이다.) 그렇게 사고체계가 돌아간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저절로 생각하게 될 땐 이미 가망이 없다.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뒤로 두 번 더 공단을 찾은 끝에 간신히 만 칠천 원 쯤으로 보험료를 깎았다.
이건 내 컴플렉스를 제대로 건드리는 일이었다. 짐짓 덤덤한 척 살아가던 나의 현주소를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복잡한 가족사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을 19만 원이 당장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할 정도로 돈이 없었고, 주중에 동사무소 한 번 찾을 시간도 없었다. 그렇다고 바쁜 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담담할 만큼 수양이 충분한 것도 물론 아니었다.
*
이렇게 보름 동안 진땀을 빼고 돌아와 앉은 토요일 술자리에서 듣는 소리가,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한남’이어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객관적으로, 건강보험 고지서로 겪은 건 단지 조금의 불편과 귀찮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난하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지 못하고, 화목하고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은 일이었다.
사실 동아리의 일원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여성 대학생들이었다. 유달리 여학생이 많던 이유는 별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계급으로만 따져 본다면, 그들은 주말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매주 토요일 밤새워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할 만큼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었다. 뭐라고 할까,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자신의 선택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왠지 그게 수상쩍고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지 않나. 물론 그것은 내가 어정쩡한 태도로 살고, 모이기만 하면 목소리가 크고, 이 사회의 문제를 다 일으키는 골치 아픈 하층계급 남성이었기 때문에 드는 자격지심이었지만.
그랬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빈정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건방진 중산층 여자애들, 니네가 뭘 알겠냐, 돈이 없어 봤냐, 시간이 없어 봤냐, 빌어먹을 건강보험 고지서 때문에 보름동안 손을 벌벌 떨어 봤냐? 생각만 했다면 손절까지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굳이 유아인을 옹호하는 말을 SNS에 올려놓은 건 그 자기연민으로부터 나온 울분 때문이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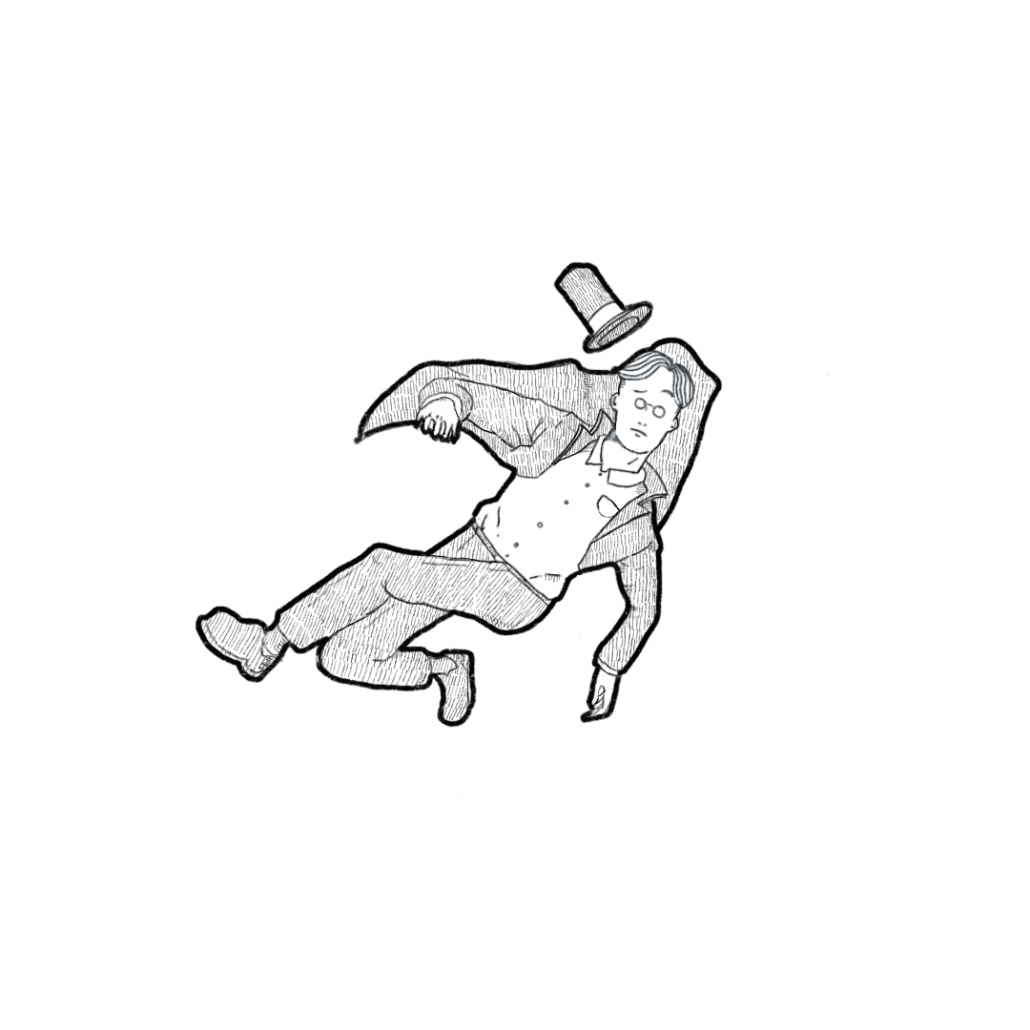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5. 재수학원 블루스 (3)](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Artboard-1@2x-100-120x120.jpg)
![[언더독 컴플렉스] #14. 죽고 싶지만 뿌링클은 먹고 싶어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