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스물셋은 밥솥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 (4)
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1.
그즈음 간절하던 것은 뿌링클이었다.
2.
나는 취향을 쉽게 바꾸지 않고, ‘최애’ 치킨의 변천사 역시 역동적이지 못하다. 치킨이라면 그저 메이커를 가리지 않던 어린 날도 있었다. 그러나 열한 살 때 이사 온 아파트 단지의 유일한 치킨집이 B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황금올리브’에 꽂힌 이후 십 년 가까이 메뉴를 바꾸지 않았었다. 여보세요? 몇 동 몇 호인데요… 네, 한 마리 갖다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 통신사 광고 기획서에 써먹었으면 좋았겠다. 짧은 통화로 전해지는 마음.
그리고 스무 살 때 ‘뿌링클’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오 년, 나의 배달의민족 주문 리스트는 변하지 않고 있다. ‘뿌링클, 콜라 1.5L’. 일 년에 한두 번쯤의 빈도로 ‘족발 中’ 따위가 있으나 그것은 필경 엄마 찬스였으리라. 기왕 ‘大’를 시키라는 엄마를 내가 말렸을 것이다. 둘이 먹는데 무슨 대짜야 엄마? 사만 삼천 원이나 하는데, 엄마는 너랑 이십 년 살았지만 늬 입을 한 명으로 셈한 적이 없어, 그래서 스끼다시 많이 오는 데로 시키잖아. 중짜 시킬게… 막국수도 딸려와.
최애 치킨마저 지고지순한 것은 무엇일까. 삶의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딱 한 가지 과자만 고르는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의 주문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다이어트 기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두 번은 치킨을 먹어 왔다. 그러므로 다른 메뉴에 도전할 기회는 매우 충분했다.
여전히 내가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로큰롤1 을 듣고 달빛요정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음악이 별로일까 겁나서가 아니다. 휴대폰 음악 어플리케이션의 ‘최근 들은 음악’ 목록에 십 년째 <공항 가는 길>(마이 앤트 메리, 2004)이 빠지지 않는 건 그저 그 노래가 내 취향을 저격하는 명곡이기 때문이다. 뿌링클도 비슷하다. 적당히 달고, 짭짤하고, 그런 만큼 금방 물리기도 해 시간을 두고 먹을 수도 있고, 여럿이 시켜먹을 때 제안하면 반대표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나의 입맛과 조건에 아주 잘 들어맞는 데다 보편적 취향 또한 충족하는 탁월한 치킨일 뿐이다.
치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재화다. 물론 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인간이란 경제주체가 원래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사정쯤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이를테면 나는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을 때 6,700원짜리 세트를 7,400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망설인다. 겨우 칠백 원 차이지만 한 끼 식사 예산이 칠천 원을 넘긴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말 맘에 드는 양털 니트가 57,000원이라고 하자. 좀 더 찾아보면 디자인은 비슷한데 어딘가 좀 싼티나는 28,000원짜리 합성섬유 니트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적립금을 적용하면 24,500원… 대부분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차액이면 세트 업그레이드가 몇 번이람? 그러나 내가 칠백 원을 더해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를 먹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런 식의 선택에서 만족보다는 후회가 좀 더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매사가 그래왔다.
그런데 뿌링클은 다른 것이다. 한 마리에 17,000원, 콜라를 추가하면 19,000원, 배달료를 추가하면 21,000원씩이나 된다. 한 달 동안 순간의 만족감을 팔아 칠백 원을 아껴 왔는데, 자제력을 잃은 어느 날 밤 30일 어치 인내심을 치킨 한 마리와 바꿔먹는 것이다.
비슷하게, 나는 일주일 동안 교통비를 내는 대신 걷거나, 사려던 새 책을 포기하고 중고서점으로 가거나 해서 푼돈을 아끼고는 한다. 그러면 꼭 주말쯤 술 약속이 생겨서 술값에 사오만 원을 훌렁 써 버린다. 2차 갈 돈이 충분했던 일은 별로 없었고 빌려서 마신 적이 많다. 못 갚고 잊어버린 술값이 몇 년간 좀 쌓여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언더독 컴플렉스>가 성공해 인세를 받으면 꼭 갚으리라. 아마 앞으로도 갚기 힘들겠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소비다. 단, 그저 좀 느슨하고 대책 없는 소비 패턴과는 궤가 다르다. 물론 나는 걷기가 취미라고 허세를 부리면서도 택시에 익숙해져 버렸다. 스타벅스 포인트를 만 원 단위로 충전하는 데 전혀 감각이 없다. 교통카드는 어차피 후불이므로 광역버스 한 번에 2,700원씩 빠져나가는 걸 체감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여 나는 체크카드 지출이 저절로 계산되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이 앱의 인공지능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따끔한 코멘트를 날린다. “카페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네요.” “12월 1주차 택시비 지출이 56,000원이네요. 차라리 차를 사지 그러세요?”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말들이다.) 이건 단순히 내가 느슨하게 소비하는 비합리적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정기적으로 치킨을 먹어야 하고 술값으로 진 빚이 밀려가는 이유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런 변명도 어쩌면 보편성을 띨 지도 모른다.
꿈꾸었던 것들이 품에서 빠져나갈 때, 나만 빼고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당황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취방, 안 빌려도 되는 주말 술값, 인턴십, 공모전 수상, 정규 아르바이트가 내 것이 아니라면 달리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그럴수록 나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계발에 매진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 쳐도, 그러는 가운데 나를 위한 작은 보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잠깐이라도 세상사를 모두 잊고 치킨에 집중하는 것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면, 한 달에 몇 번 뿌링클을 영접하는 것쯤은 어쩌면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3.
여름이 되었다. 상수동에 살며 스타트업의 막내 인턴이 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삼 개월 동안 받은 돈은 모두 47만 원이었다. 최저임금 7,53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고 천 원 단위는 올림한 4월분 월급이었다. 그나마 20만 원은 형들과 분담한 월세 명목으로 제했으니 실제로 입금된 돈은 27만 원이었다. 5월에도 6월에도 비슷한 시간을 출근했다. 수업을 빠지는 일이 가끔 있었고, 밤늦게 퇴근한 일은 잦았다. 형들이 오후에 출근했기 때문에 나도 늦게 남아 있어야 했다. 5월부터는 적은 돈이나마 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 개월이 좀 넘는 인턴 생활 동안 내가 받은 보수는 27만 원이 전부였다. S형은 항상 자금난으로 고생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와 나는 함께 자주 걸었다. 퇴근한 늦은 밤, 터덜터덜 걸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강이었다. 할 수 있는 여가는 그게 거의 전부였다. 집 앞엔 힙한 술집도 심야식당도 많았다. 홍대거리에 접힌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당인동 주택가의 소담한 골목이었고, 그곳이 입소문을 타던 시기였다. 하지만 상수동에 사는 동안 그 중 어느 한 군데를 무람없이 들어갈 수 있던 적이 없었다.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여름 초입 강바람은 습도가 낮고 농도가 옅었다. S형은 항상 희망적인 전망을 말했다. 당인리 발전소를 지나 양화대교까지 걷는 동안 그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비슷하고 지지부진한 레퍼토리를 읊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G교수 건이 곧 해결될 것이다, 그것만 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H약품 임원과 다음 주 미팅을 할 것 같다, 투자를 제안할 건데 너도 같이 가면 어떨까?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그럴 듯 했다. 강 너머 여의도의 야경이 멀거니만 보였다.
고개를 주억거리며 함께 G교수의 위선을 비난하고 H약품 임원이 구두로 약조했다는 엄청난 액수로 미래를 상상하다 보면, S형이 그 교수의 돈을 갖고 얘기한 지 삼 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과 공중파 TV CF 에 팡팡 돈을 쓰는 H약품의 사세(社勢), 그에 반해 2018년 상반기 동안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의 IR 덱(사업계획서) 따위는 잊어버리게 되었다. 분명 녹초 같은 꼴로 집에 들어와 쉬지도 않고 떠난 산책이었는데, 돌아오면 어느덧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라 그랬던가.
과제에 바쁜 이 나라 대학생들은, 밤을 새다 하늘이 파래 오는 걸 느끼면 야릇하게 차오르는 혈기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 안으로 제출할 수 있겠는데? 실상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도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그 설레는 기분.
그것으로 버텼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 닥쳐든 궁핍까지 해결해준 것은 아니었다.
계속
1 W&Whale, <Too Young To Die>
“너의 노래 the Youth Gone Wild / 그야말로 철없는 녀석 /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Rock’n’roll / 빛바랜 그 날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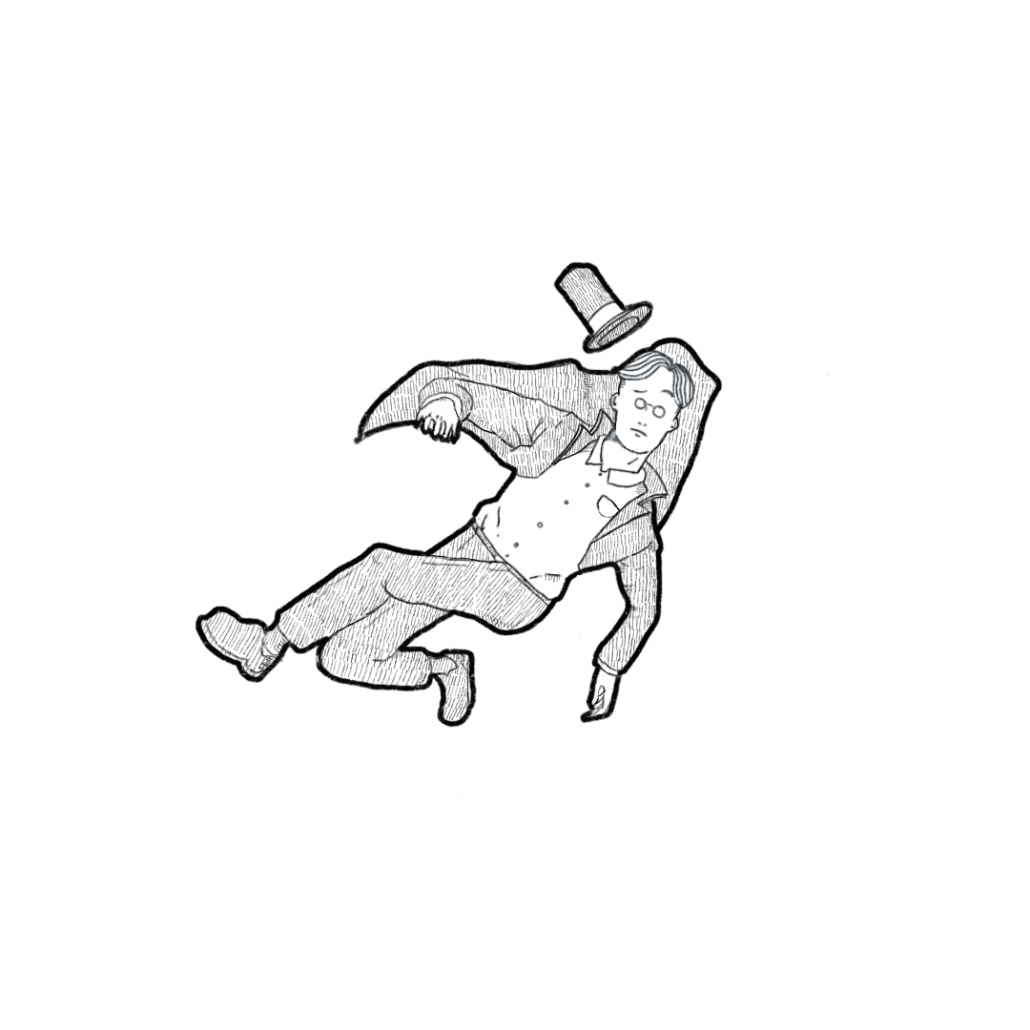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2.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 (2)](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untitle25d-120x120.jpg)
![[언더독 컴플렉스] #16. 함께 있어도 홀로 (2)](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
![[언더독 컴플렉스] #13. 스물셋은 밥솥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 (3)](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3/KakaoTalk_20200325_195928736-120x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