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4.
“세계 혁명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처럼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동계급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혁명의 시발점인데, 똑똑한 유럽의 정치가들은 노동자들의 원성이 폭발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죠. 그 직전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줬어요. 복지란 개념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강아지를 굶기면 주인을 물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을 만큼 하나씩 먹이를 던져주면 주인 말을 잘 듣더라는 거죠.”
참으로 맞는 말이었다. 그 학기에 들었던 복수전공 ‘정치학 개론’ 막바지였다. 정치학의 계보를 훑어본다는 수업이었다. 삼월 초 북아현동과 보광동을 돌아다닐 땐 홉스와 로크였다. 상수동 생활에 지쳐갈 무렵엔 거의 마지막 주차였다. 마르크스,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회주의 이념가 서너 명을 2주에 걸쳐 다루고 있었다. 훑어본다더니 노트북으로 내용을 받아쓰면 수업 한 번에 열서너 장이 나오던 강의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사족도, 이해하지 못할 설명도 없었다. 교수는 나와 정치 성향이 정반대였다. 내가 듣기엔 좀 불편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으나 강의만은 탁월했다.
이전 정권의 수석비서관급 인사로 유명했던 그는 학생들에게 시니컬하기로는 더 유명했다. 그가 딱 한 번 나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다. 중간고사 다음다음 수업 때였다.
“중간고사 점수는 A+인데 결석이 세 번이야. 한 번만 더 빠지면 F다. 집이 먼가?”
상수동으로 이사하던 날이 중간고사 다음 주 수업이었다. 쿨하게 결석하고 두 시간 동안 장롱을 옮긴 바 있었다. 1학년도 아니고 3학년 1학기였는데 참으로 한심한 짓이었다.
종강을 앞둔 유월 중순, 교수님은 수업 내내 혁명가들의 실패를 납득시켰다. 후대 학자들의 분석을 빌리면서도 묘한 빈정거림이 묻어난다고 느꼈는데, 아마 느낌이 맞을 것이다. 왜 사회주의가 ‘망했나’? 독립 변수는 뭐였을까요? 교수님이 제시한 건 당연히 하나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변인은 떠오르지 않는다. “죽지 않을 만큼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빼고는.
좌파정당의 당원이자 온전한 지성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도 싶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당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뿐인 페이퍼 당원이고, <자본론>을 중2때 읽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글자를 읽었을 따름이다. 진보정당원을 자부하기엔 민망했고 지성인은 더더욱 아니었다. 차라리 중학생이었다면 호기를 부려봤을 수도 있겠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라면 계급 외(外) 투쟁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까요… 이성적으로 선택한 계급투쟁이 뜨거운 감성으로 폭발한다면… 하지만 대학교 3학년씩이나 되어놓고 그러기엔 근 몇 년간 읽은 책이 손에 꼽는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계속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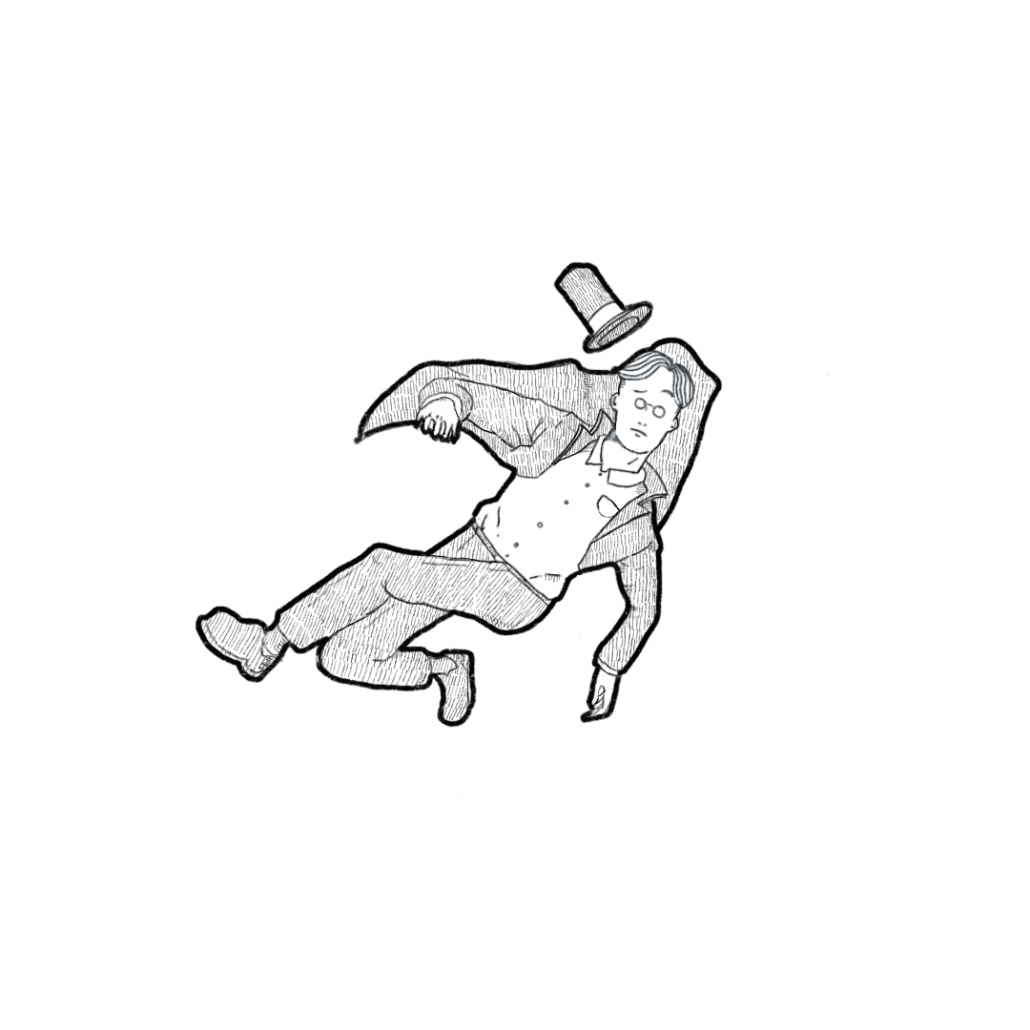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14. 죽고 싶지만 뿌링클은 먹고 싶어 (6)](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
![[언더독 컴플렉스] #10. 사당역과 동부이촌동 사이의 페이크 지식노동자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6/1-120x120.png)
![[언더독 컴플렉스] #10. 사당역과 동부이촌동 사이의 페이크 지식노동자 (4)](http://2-um.kr/wp-content/themes/redwaves/images/nothumb-120x12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