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화. “어려운 사람이 안되는게 너무 어려워” -치우친 취향에 대하여
가족보다 멀고, 이웃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육아를 꾸려가며 겪는 좌충우돌이야기
매주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오로지 내 아이를 잘 기르겠다는 일념으로 부모라는 이름의 천차만별 ‘어른이들’이 모였다. 가족보다 멀고 이웃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꾸려가며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들. 때로는 낯 뜨겁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용기 있고 어리숙한 내 안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 지금 어른이들의 등원이 시작된다. 웰컴! 공동육아!
-평가 인증하기
이참에 우리도 평가인증이란 걸 해보기로 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보육기관에 점수를 매기는 일이다. 몇 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고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지원이 탐나서 인증을 받기로 했다. 이 제도가 가정에서 내 아이를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보통의 어린이집은 내가 직접 들어가 생활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떨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은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곳을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어린이집이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딱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에서 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육아에서는 CCTV 미설치 동의서만큼은 모든 부모에게 받았다. CCTV 설치는 보육기관에서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미설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이 이에 백 퍼센트 동의한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우리에겐 감시카메라가 필요 없었다. 이미 내 집처럼 드나들며 직접 꾸려나가는 곳에서 굳이 교사들을 감시할 필요도 부모들에게 보일 점수도 필요치 않았다.
“아휴, 어린이집 사정 이젠 그만 좀 알고 싶어요.”
아마(아빠+엄마)들은 너스레를 떨며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일은 엄청난 양의 자료와 문서화 작업, 교사들의 업무량 등 갈아 넣을게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선생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평가 인증 한 번 준비하면 자궁에 혹이 하나씩 생긴다고요.”
예전에 일반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다던 도토리가 말했다. 그만큼 평가인증 하나를 준비하는데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엄청나다는 뜻일 거다.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만으로도 엄청난데 사실 그럴 만도 하다. 국가의 한 부서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평가하려면 ‘문서’라도 꼼꼼해야 하지 않을까?
공동육아에 그런 필요가 덜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다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해 나가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각 소위에(운영, 재정, 시설, 홍보, 교육)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하며, 일 년에 두 번의 총회가 있고, 수시로 ‘아마’활동을 위해 터전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 이런 점들이 일반 어린이집과는 확연히 성격이 다르다. 거기에 수익성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를 잘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아마 전국 어린이집을 공동육아화? 한다면 평가인증의 수고로움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돈(나라에서 주는 돈!)이 필요했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평가인증이 당연한 체크리스트가 되어가는 흐름을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는 없기에 과감히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워낙 일이 많은지라 현재 이사회와는 별개로 평가인증 준비위원회가 필요했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전년도 이사회가 위원회가 되었다. 고로 봄이와 통통, 샘물과 내가 소환되었다. 첫 모임에서 봄이는 정부에서 배부된 평가인증 관련 책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두꺼웠다. 책 안에는 항목별 체크 사항들이 빼곡해서 꼭 국가고시 문제집 같이 보였다.
“이거 정말 엄청 많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바다에 들어간 달팽이가 된 기분으로 책장을 넘기며 난감해하고 있는데 통통이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 지원금?”
“(결연하게) 끄덕끄덕. 우린 누구랑 경쟁하기 위해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점을 맞는 게 목표도 아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체크리스트를 보고 만들어가면 돼요. 딱 인증 합격선까지만 해봅시다!”
그렇게 매주 두 번씩 저녁이면 책상 앞에 모여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평가인증의 구체적인 지표가 유형별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 또 세부 항목별로 문항들이 들어 차 있었다. 넷이서 각자 맡았던 이사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기로 하고,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같이 문제를 읽어나갔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나오면 담당자가 다음 모임까지 준비해오는 식으로 문제집 풀 듯 한 장 한 장 풀어나갔다. 예를 들어 보육과정이나 교수법에 대한 부분은 교사 봄이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정 담당 통통이, 안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시설 샘물이, 가족과의 협력 소통에 대한 부분은 홍교인 내가 맡았다.
“바깥 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잘하는데요~”
“유아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즘 같은 날씨엔 오전 내내 밖에서 놀고 오후에도 밖에서 있고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 완. 전. 주도적이죠.”
개정되었다는 평가지표의 내용들은 신기할 정도로 공동육아의 가치관과 닮아 있었다. 꼭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지표 목록을 만든 것처럼 새로울 게 없는 평범한 터전의 모습이었다. 우리 같이만 하면 지표의 정석이라며 자주 손뼉을 마주쳤다.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일등 공신은 역시… 거북이네요.”
스터디 때마다 우리의 밥을 챙겨주는 거북이를 보며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은 모여서 한솥밥을 먹으며 공부했다. 그리고 일주일간 흩어져 숙제를 한아름씩 안고 나타났다. 장기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조합원들 교육 후기, 자료, 사진들 카페에서 모두 찾아내서 정리했어요.”
“아이들 날적이도 전부 옮겨 적어 정리했어요.”
“이걸…. 다 손으로 하셨어요?
“타자가 익숙지 않아서요.”
그러나 지표를 잘 지키는 일과 그것을 인증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한 듯 해오던 일들 하나하나를 인증하기 위해 기록과 자료를 찾고 정리해 문서화시켜 나갔다. 시설이라던가 비용 내역처럼 정확하게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지표들도 많았다. 아이들 수에 맞는 낮잠 공간의 분리, 교사 공간, 부엌 공간과 휴게공간이 나오질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여기, 이 공간을 책장으로 막고 휴게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책장이 위험해서 안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해서 못 참고 들락날락할걸요.”
공동육아만의 특성이 현 보육 법규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 아마나 맛 단지 아마 같은 활동은 공동육아 고유의 것인데….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답답하네요. 이걸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은 시스템인데….”
열심히 지표를 들여다보다 보니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공동육아만의 특성, 효율적이지 못한 형식들,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옳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평가인증을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갔다. 그리고 몇 달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결전의 날, 현장 평가의 아침이 밝았다.
“아침부터 너무 떨려요. 준비한 대로만, 준비한 대로만!”
봄이의 출근 문자를 보고 모두가 시험장에 선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렸다. 심사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들이닥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본다. 아이들이 등원하면 먹는 것, 나들이, 노는 것, 낮잠시간, 하원까지 모든 것을 밀착 관찰하며 기록한다. 하원 후에는 준비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며 어린이집 실정과 대조해본다. 마음만은 터전에 가 있던 긴 하루였다.
“끝났어요!”
봄이에게 온 카톡 알림을 보자 다시 가슴이 쿵쾅거렸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곳은 처음 봤다고….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곳 같다며 가셨어요.”
“오…. 다행이에요!”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정도 반응이면 결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봄이에게 들은 후일담으로는 심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이들 이였다고 한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반말로) 말을 걸며 “누구야?” “터전에 왜 왔어?” 나들이 길 내내 꽃과 돌멩이를 주워다 주며 “자, 이거 우리가 주는 선물이야.” (손까지 잡고) 함께 해주었다.
“아이들 눈이 정말 맑아요.”
들어올 때의 깐깐했던 심사관들은 돌아갈 때는 어느새 아이들의 눈빛에 매료된 듯했다. 아마…. 그들도 아이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봤을 것이다. 수많은 문서와 자료를 뒤져서라도 찾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아이들의 행동, 말투, 표정에 모두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우리는 평가인증 합격점을 받았다.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합격만 하자’ 보다 더 높은 등급이었다. 너무나 뿌듯했다.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곳을 얼마나 뜨겁게 고민하고 사랑하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랬다. 경쟁하고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느라 온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재미가 있다. 남이 뭐라든 합격이든 경쟁에서 이기든 그런 뻔한 것들이 아니어서…. 함께 사랑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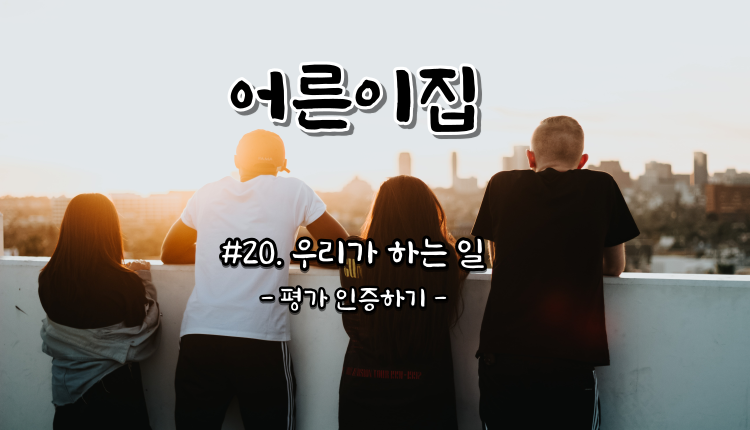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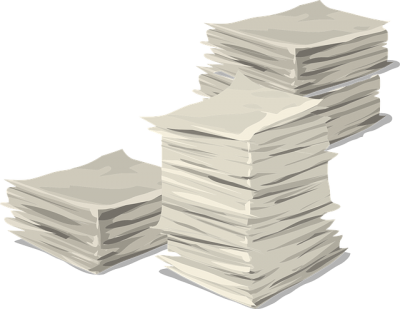
![[어른이집 6화] “어젯밤 동네에서 있었던 일” – 방모임 에피소드 1](http://2-um.kr/wp-content/uploads/2022/07/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8-3-120x120.png)
![[어른이집 9화] “서로를 읽는 시간” -모꼬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룻밤](http://2-um.kr/wp-content/uploads/2022/07/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8-120x120.png)
![[어른이집 25화] “세상에 그냥 스쳐갈 소리는 없다” -7년의 공동육아, 그리고 퇴소](http://2-um.kr/wp-content/uploads/2022/1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8-6-120x12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