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스물넷이 됐다. 어느덧 목동에서 육 개월 넘도록 ‘사탐 대표 강사’를 하고 있었다. 부질없는 타이틀이었으나 약간의 배덕감은 있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었고 별로 행복하게 일했다고는 못하겠다. 어쩐지 권태로울 때, 또는 우연히 시작한 일들이라야 오래가나 보다. 과목 특성상 일전의 과외나 파트 강사 일은 길어야 넉 달을 넘지 못했었다. 이것도 기껏해야 석 달이나 하겠거니 싶었는데 아니었던 게다. 열망한 일들은 다 조져지더니 이건 좀 오래 가는구만. 그러나 반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일정한 돈을 벌고 두 학기째 휴학 중이었으니, 시나리오나 희곡을 쓸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시도를 아예 않았던 것은 아니다. 두 시간짜리 강의를 맡으면 한 시간은 강의하고 한 시간은 기출 문제를 풀게 했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노트북을 펴고 이런저런 시놉시스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쓰이는 문장은 한 줄도 없었다. 스트레스를 못 견뎌 바로 앞 전통시장의 분식집에서 오뎅 서너 개를 씹고 들어왔다. 나는 아주 고약한 선생이었다.
목동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익히 아는 목동 – 현대백화점, 방송국, 아파트 대단지, 말도 안 되는 일방통행 차로 – 은 아니었다. 처음 나를 태워다 준 택시기사 아저씨는 “목동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라고 했으니. 거기와 좀 동떨어진 올망졸망 주택가 시장통의 작은 학원이었다. 출강 오는 선생을 합해도 예닐곱이나 될까 했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 출근하는 선생은 다섯이었다. 원장, 부원장, 수학쌤, 과탐쌤, 그리고 ‘사탐쌤’ 나였다. 과탐쌤은 과탐 대표 강사로 소개되었으나 수학쌤은 아니었다. 부원장이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 오는 국어쌤 둘이 있었다. 수학쌤은 스물여덟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른을 훌쩍 넘어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솔직히, ‘하빠리’ 학원에 있는 그들을 조금쯤 한심해했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나는 조금 비켜선 입장이라고 여겼다. 스물넷인 나는 가장 어렸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학원과 과외를 잠깐의 돈벌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장선생 말고는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국지리만 가르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맡는 과목이 늘어갔다. 한국사,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정신을 차려보니 거의 모든 사회탐구를 다루고 있었다. 잘 아는 과목도 있었지만 아닌 것도 많았다. 그럴 때는 수업 시간 전에 EBS 강의를 베끼거나 답지를 외워서 들어가거나 주워들은 지식을 끌어다 썼다. 맡은 아이들의 성적은 그럭저럭 상승하는 편이었지만, 다시 말하는데 나는 아주 고약한 선생이었다.
그렇게 무리한 이유가 내 돈 욕심 때문이라는 걸 부정하진 않겠다. 40만 원짜리 단과로 시작한 것이 많을 때는 합해서 240만 원어치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절박하기도 했다. 작은 학원이나 큰 학원이나 국영수도 아닌 과목에 강사 T/O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나의 대체자는 널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영어도 수학도 신통치 못한 선생이라면, “세계사도 되시죠?”라는 원장의 물음에 따질 것 없이 “네!”라지 않고 어찌 돈을 벌겠는가?
하지만 그 학원 원장이 아니었다면 소용없었을 것이다. 좋게 말하면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쁘게는 예의가 없었다. 주말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왔다. 안 받으면 계속 걸었다. 내용은 대개 이런 것이었다. ‘내일 오후에 학부모랑 상담을 좀 하셔야겠어요. 사회탐구 한다던데.’ 출근하지도 않는 날에 별안간 나오라니 아주 짜증스럽고 피곤한 일이었다. 그러나 싫지만은 않았다. 원장은 유일한 사탐 선생인 내게 두말없이 상담을 붙였다. 상담이란 곧 고객 유치 쇼케이스였고, 성공적이라면 한 달에 –원장과 협상하기에 따라- 적게는 27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 돈을 줄 학생의 가련한 학부모를 만나보는 데 나 역시 주저함이 없었다.
그렇게 잡힌 상담은 학생을 대동한 학부모, 그리고 원장과 함께한다. 원장에게서 여러 가지 포장법을 배웠다. 소속 강사들의 학력이나 경력을 먼저 깔고 들어간다. 물론 이것도 대부분 부풀려 얘기한다. 대학 간판이나 경력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그다음 있을 여러 가지 헛소리와 과장, 거짓말들 -공부법, 합격시킨 대학 등-에 부여되는 권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서 따위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이삼심 분 동안 순진한 학생과 무구한 부모들을 현혹하면 되는 것이다. 원장은 거간꾼 역할이었지만 발화의 대부분은 그녀의 주도였다. 여기 계신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소극적 사기꾼 역할에 주저함이 없었다.
“보이는 게 전부예요.” 언젠가 원장이 해준 말이다. 정말 그랬다. 물론 과외 앱에 프로필을 등록할 때는 학생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따위를 인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그만 곳에서라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나? 이상하게도 대형 학원보다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곳이야말로 학부모를 주눅 들게 한다. 이를테면 M스터디나 C학원 같은 곳에서 선생의 이력을 물어보는 건 객쩍은 일이다. 물어보나 마나 좋을 테니까. 그러나 소형 학원에서 학력과 이력을 묻는 것은 객쩍다기보다는… 그런 학원의 원장들은 너무 억센 사람들이란 티가 나서, 언제라도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거다. “그걸 따지시려면 큰 학원에 가셔야지.” 우리 학원의 원장도 마찬가지여서, 뭔가를 물을 틈을 주지 않고 학부모들을 몰아댔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세게 얘기하면 그게 다 진짜처럼 들렸다. 자세히 듣다 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내용도 있었지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프랜차이즈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들 자격이 없는 것처럼 움츠러드는 것일까. 시장통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불쌍한 엄마와 아빠들. 상담을 하는 자리에선, 항상 보이는 게 전부였고 말하는 건 모두 참이었다.
부원장의 공식적 이력은 Y대 수학과 학사였지만, 실제로는 그 학교를 중퇴했을 뿐이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녀 학력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언젠가 원장과 부원장과 셋이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원장은 시장에서 떡볶이나 김밥 같은 것을 곧잘 사 와서 나눠 먹고는 했다. “사실 이 사람이 졸업을 못 했어요. 중퇴에요.” 전혀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 원장이 화제를 돌리며 꺼낸 첫마디였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단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민감한 소재를 쓴 것이다. 원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부원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엷게 웃으며 눈을 오른쪽으로 내리깔고만 있었다. 원장은 그런 사실을 –당연히-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법은 없었지만, 선생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다. 이런 언급이 누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것이란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부원장의 중퇴 사실은 그녀를 높이는 듯 낮추는 듯 아리송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요컨대,
“이 사람이 수업을 얼마나 잘하기로 소문이 났으면 대치동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나요, 오라고. 그런데도 여기 시장통에 나랑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고 온 거예요. 학교 졸업을 못했어도 그런 건 강의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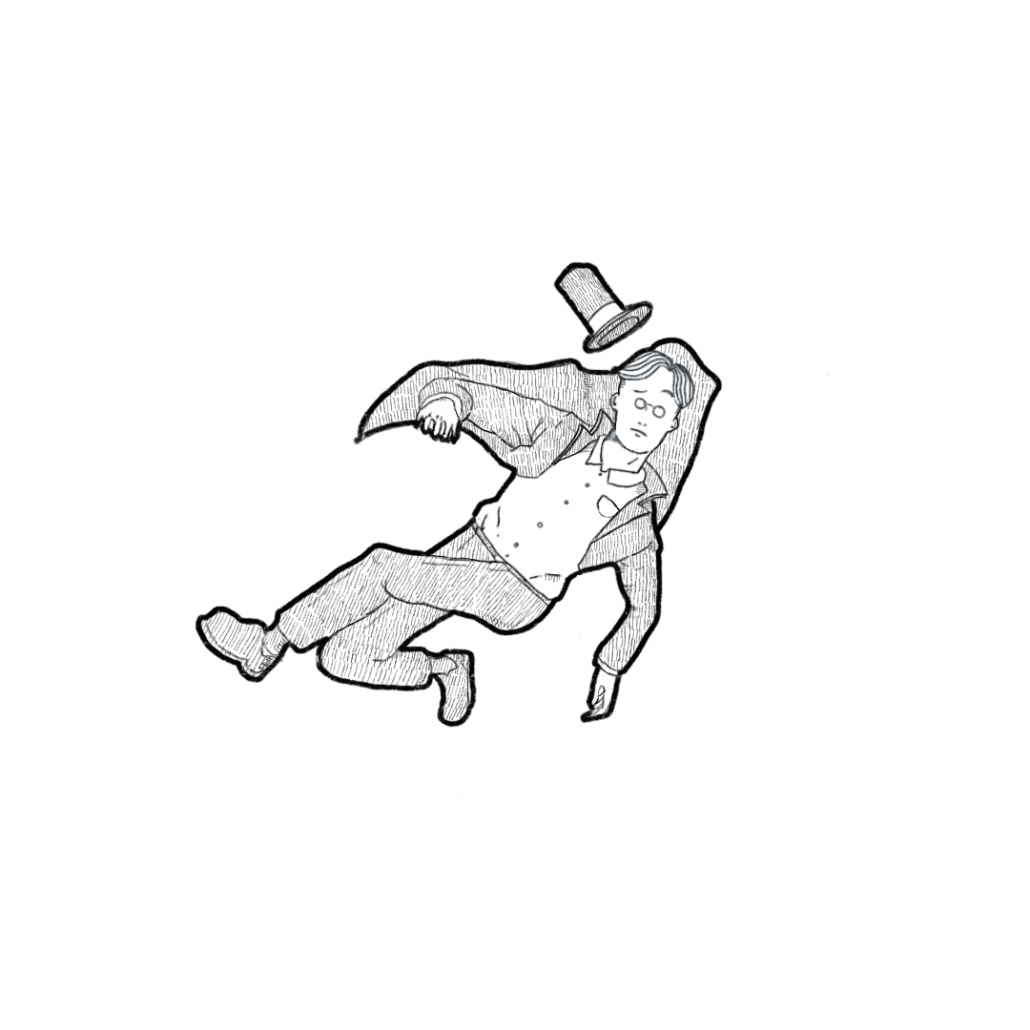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8. 로컬 히어로의 와리가리 (3)](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5/KakaoTalk_20200506_013759359-120x120.jpg)
![[언더독 컴플렉스] #14. 죽고 싶지만 뿌링클은 먹고 싶어 (4)](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