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담담하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청춘실패담
매주 월,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입대하던 해 봄, 연극 한 편을 올리게 됐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연출 입시를 배웠던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너 연극 배우러 학교 간다더니 왜 안 하냐, 대체 뭐 하냐? 아 지금요, 학원에서 돈 법니다… 2019년 2월, 그게 전부였다.
학교에 들어간 지는 3년, 학교에서 도망간 지도 거의 3년이었다. 기껏 대학에 갔더니 광고 공부를 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더니 창작극이 엎어지고는 아예 학교와 연을 끊었다는 근황만 전해 들었던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선생님은 겨우 한 달 공부해서 입시를 ‘뚫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었다. 나는 그 실체를 스스로 대단히 의심스러워했으며 내가 알맞은 전형을 만난 덕이란 걸 알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매년 하던 워크숍이었다. 예년과 다르게 사회성이 있는 작품을 한다고 했다. 분석부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였다. 194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데 남자 주인공의 모델이 박정희였다. 정권이 바뀌기 전 초연한 작품이었고, 연극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출가를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한 연극이었다. 선생님은 입시 시절 지원동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던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이 어쩌구 사회성이 어쩌구. 소재가 박정희, 친일, 혈통, 만주국 따위가 아니라 보통처럼 로맨스였다면 나는 이 연극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잘 아는 대로, 나의 연극 경력은 일천했다. 1학년 때 무대 작업 일주일, 2학년 때 엎어진 창작극 작가… 그게 끝이었다.
“뭐 드라마터그도 있고….” 드라마터그란 사실상 자문역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심 연출을 권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화 너머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던 것이다.
연기학원에서 입시생이나 출신 재학생, 졸업생을 불러다 만드는 연극은 흔하고 기껏해야 지인이나 초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 쏟아지는 열정은 덜 세련되었을지언정 상업연극에 못지않다. 그러니까 장난도 아니고, 아무리 학생들이 오르는 작품이라지만, 학교에서 조연출 한 번 못 하고 나이만 찬 (내 손으로 이 대목을 쓰려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가 연출을 하는 건 무리였다. 연극을 만들고 그걸 다 책임지는 자리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도 학원과 과외만으로도 한 달에 사나흘이나 쉴까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나는 덜컥 연출을 맡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물론 명색이 연출전공인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자격지심에 후배에게 연출을 맡겨놓고 내가 쓴 작품이 사라지는 경험이 쓰라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경험이 쥐뿔도 없으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연출을 시켜달라고 조른 것은, 이제는 무언가를 극복할 때라는 본능이 시킨 것이다.
열서너 살 무렵 주말마다 시즌 티켓을 끊어 혼자 축구장에 출석했던 적이 있다. 어지간하면 경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도록 남아있는 게 버릇이었다. 언제 한 번은 감기가 너무 심했다. 2008년 언젠가,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토요일 낮 경기였다. 챙겨온 두루마리 휴지를 전반전 동안 절반은 썼다. 몸도 으슬으슬한데 옆 관중들에게 민폐까지 끼치니 삼십 분도 앉아 있지 못하고 나왔다. 그런데 코를 훌쩍이며 출구를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화창한 오후 하늘을 가르는 관중들의 그 울림. 이어지는 파동이 길지 않았으니 골은 아니었다. 90분 동안 몇 번이고 나오는 아쉬운 슛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토록 쉽게 이 경기를 포기한 걸 후회했다.
눈을 질끈 감는 기억이다. 친구들과의 자전거 여행에 끼지 못했던 일곱 살, 친구들과 취향을 나눌 수 없었던 열 살, 좋아하는 축구팀을 당당하게 내보이지 못하던 열일곱 살, 사랑하는 가수를 티 내지 못했던 열아홉 살, 울면서 대학로를 걸어 내려온 스물한 살, 쫓겨나듯 동아리에서 물러난 스물세 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물러앉아 배추전이나 씹으며 엄마 얘기가 제발 화제에 오르지 않기만을 바라던 24년. 축구장의 함성을 등졌던 기억은 연극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숱한 정신적 외상과 같은 자리에 있다. 어디에서나 적응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한가운데에서 겪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물러나 애매한 주변에 머물러서 무엇이든 오롯이 즐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모든 걸 망쳐도 주인공을 해야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든 생각은 그랬다. 이제는 주변을 맴돌 때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마음이 급한 시기였다. 스물넷에 앞으로 뭘 할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남은 건 입대밖에 없을 때. 그 시절 꼭 그 작품이 아니었어도, 연출이 아니라 배우였더라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서 다른 일을 제안했어도 나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누가 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한 듯 3년을 허송세월했으면서도, 그것은 연극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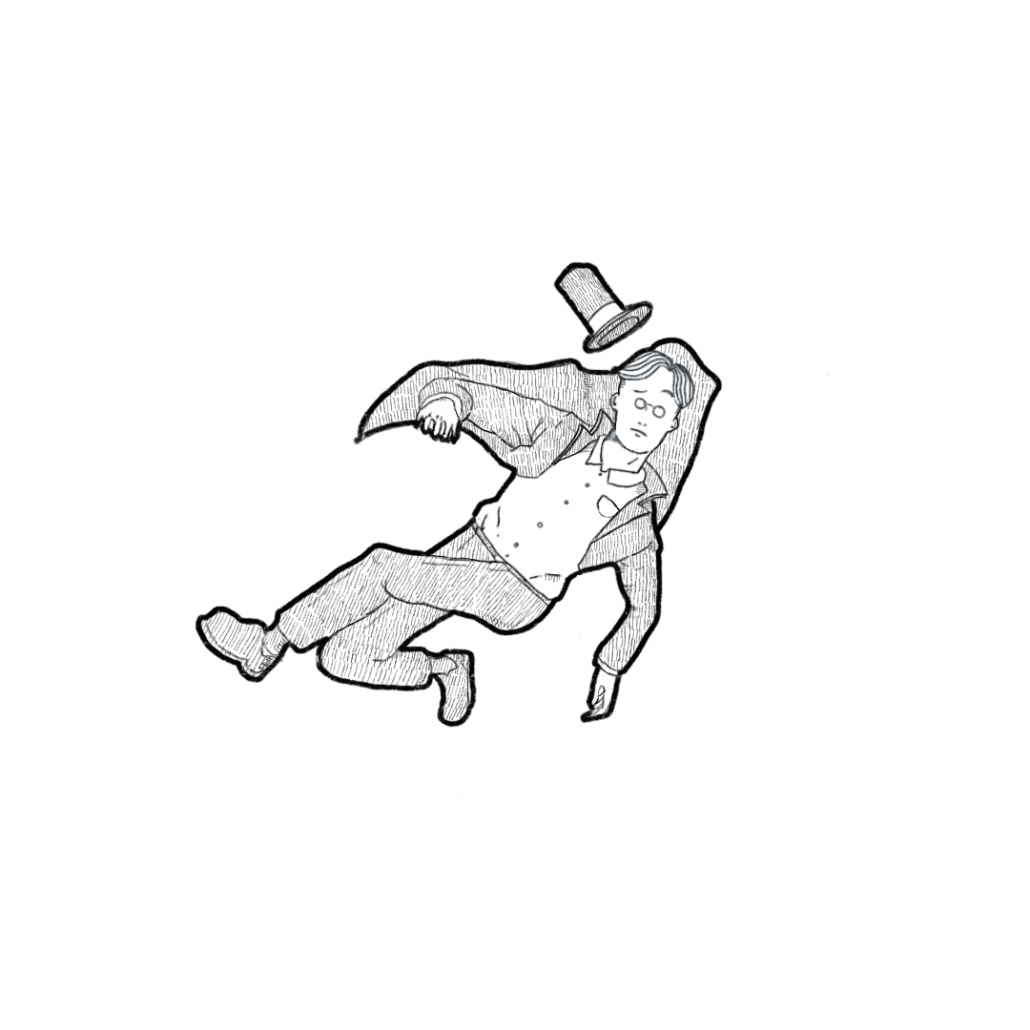

![[언더독 컴플렉스] #3. 우상 (2)](http://2-um.kr/wp-content/themes/redwaves/images/nothumb-120x120.png)
![[언더독 컴플렉스] #14. 죽고 싶지만 뿌링클은 먹고 싶어 (4)](http://2-um.kr/wp-content/uploads/2020/02/Artboard-1@2x-120x120.png)